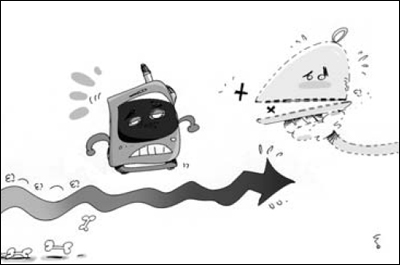|
통신업계가 성장 정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전화시장 등 기존 서비스는 물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3세대(3G) 이동통신, 와이브로, IPTV 등 최근 선보인 서비스들 역시 성공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면서 ‘다음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인 유무선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매출 성장률은 시장 포화로 인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KT의 매출액은 최근 7년간 11조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0.4% 늘어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KT보다는 낫지만 SK텔레콤의 매출 성장률 역시 밝지 만은 않다. 지난해에는 6%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 절반인 3% 성장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하락 속도를 감안할 때 연말에는 증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성장 정체를 뚫고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데 있다. 당초 통신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3G서비스는 본격화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눈에 띄는 핵심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이동통신’에 머물고 있다. 와이브로 역시 초고속이동통신과의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신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몇 년을 먹여 살려줄 ‘거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방통융합의 총아’라며 조명을 받았던 인터넷(IP)TV도 최근 들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쌓여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IPTV에 대해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장동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거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통신업체 기술담당 임원은 “ETRI와 같은 국책연구소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며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