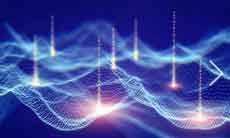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
1조9,057억달러. 미국인들이 지출한 연간(2005년) 의료비다. 한국이 일년 동안 생산한 상품이나 용역 합계(국민총생산)의 2.4배가 넘는 돈을 쓰고도 미국은 최악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국민의 15%가 무보험자다.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병원비도 비싸기 짝이 없다. 출산 후 하루만 지나면 퇴원해야 하는 산모가 병원에서 하루 묵는 비용이 1만달러. 보험이 없다면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무보험자가 가운데손가락을 사고로 잃었다면 접합수술에 6만달러를 내야 한다. 파산자 절반의 파산 이유가 의료비 지출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치료해줘야 하는 응급환자 중에는 수술 후 도망하는 경우도 많고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보험금은 갈수록 적어진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은 어디로 간 것일까. 민영 보험회사다.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는 병원은 보험사의 눈밖에 나 보험사와 계약한 환자를 받기 어렵다.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보다 보험사의 호주머니를 살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험사의 눈을 의식해 검사항목을 줄이는 경우도 많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시작된 것은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ㆍ환자를 뜻하는 속어)’에는 닉슨이 민영 보험업자들의 이익과 부합하는 신의료보험정책을 단 하루 만에 결정, 1971년 2월18일 발표하는 비밀 녹화 테이프가 소개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로비에 막혔다. 클린턴은 ‘의료사회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뒤집어 썼다. 문제는 한국이다. 공적 의료보험의 핵심인 ‘당연지정제’ 폐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시장원리도 좋지만 국민건강이 자칫 미국식 의료보험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