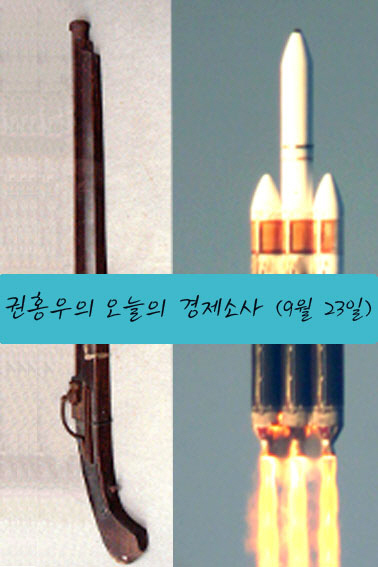조총(鳥銃). 우리 민족에게 수난을 안겨 준 총이다. 말 그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총에 무수히 많은 조상들이 죽었다. 임진년에 쳐들어 온 왜적을 맞아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친 신립 장군의 기병이 조총에 무너졌고 성웅 이순신 장군도 조총에 맞아 생을 마쳤다.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임금 선조를 구하겠다던 전라·경상·충청의 5만여 남도근왕군은 용인 부근에서 철포(鐵砲·조총)와 기병으로 구성된 1,600여 왜군 혼성부대에 깨졌다. 민족사를 통틀어 최악의 치욕적 패전인 용인전투(1592년6월)에서 농민 근왕병들은 ‘천둥 벼락’ 소리 같은 조총의 발사음에 놀라 도망쳤다.
일본인들이 조총을 처음 접한 시기는 1543년9월23일(음력 8월25일). 종자도(種子島·다네가시마) 남단에 표류한 중국인 무역상의 난파선을 통해서다. 처음 보는 대형 선박(난파선은 길이 45m였다니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보다도 두 배 이상 길었다)에 놀란 일본인들은 필담 끝에 난파선에게 상륙 허가를 내렸다. 종자도의 작은 배 12척을 동원해 겨우 구조한 난파선의 선원 110여명 중에는 이상한 모습의 사람 세 명이 타고 있었다.
높은 코에 붉은 머리와 눈, 처음 보는 복장…. 중국인 선주는 일본인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서남방 오랑캐 종족의 상인으로 그리 괴이한 인간은 아니다.’ 기이한 불청객 3명은 남만인(南蠻人·포르투갈인)이었다. 중국인이 남만선을 운항하는 것도 이상한데 포르투갈인들이 왜 중국 배에 탔을까. 중국인 선주 왕직(汪直)은 동남아와 마카오, 일본까지 영역으로 삼았던 국제 무역상. 마카오에 진출한 포르투갈인들과도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해적을 통칭하던 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왕직은 왜구의 소굴인 규슈로 가려다 태풍을 만나 표류했던 것이다. 종자도주는 표류객 전원을 한 절에 숙식시키며 선박 수리를 도왔다. 종자도주의 관심은 남만인들에게 쏠렸다. 망원경과 항해 도구는 물론 불을 뿜는 철 막대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남만선의 수리는 자연스레 늦어졌다. 선박을 수리할 큰 못이 없다는 이유로 남만인들이 6개월 동안 묶여 있는 동안 젊은 종자도주는 두 가지에 매달렸다.
첫째 스스로 철포(뎃보)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철포에 매료된 그는 남만인에게 명(明)나라 영락전 2,000필(匹)을 주고 한 정을 사들였다. 당시 동양세계의 국제 통용화폐였던 영락전으로 상상을 넘는 거금을 받은 남만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한 정을 더 줬다. 요즘 돈으로 약 10억원. 한 정당 5억원씩 지불했던 셈이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본의 선승 미우라 후지유키(南浦文之)가 1606년 저술한 ‘철포기(鐵砲記)’를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표류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도주(島主)가 과연 거액을 내줬을지는 의문이다. 110여명의 6개월간 숙식과 선박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점도 미심쩍다.
종자도주의 두 번째 관심사는 복제 생산 여부. 철포 국산화를 위해 섬의 모든 역량이 동원됐다. 종자도는 사철(沙鐵)이 풍부해 제철과 칼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 종자도주는 일본도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불러 철포 제작을 명령했다. 결국 이들은 뜻을 이뤘다. 철포 국산화 프로젝트를 맡은 책임기술자의 딸이 핵심 기술 전수를 꺼리는 포르투갈 기술자에게 몸을 바쳐가며 이룬 결과다. 철포 제작을 위한 국제 결혼은 러브스토리로 포장돼 ‘철포전래기’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다.
종자도주가 철포에 관심을 쏟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철포의 가능성을 알아봤다. 일본 열도의 패권을 놓고 군웅이 할거하는 센코쿠(戰國) 시대에 세상을 바꿀 무기로 철포를 주목한 것이다. 두 번째, 종자도주에게는 당장 갚아야 할 원수가 있었다. 남만선이 표류하기 불과 5개월 전에 인근 섬 숙적의 침입으로 재산과 영지를 빼앗겼던 종자도주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철포 국산화에 성공한 종자도주는 이듬해 원수의 섬으로 진공, 복수에 성공했다. 상대편은 철포의 발사음만 듣고도 혼비백산했다고 전해진다. 잃었던 영지를 되찾은 종자도주는 철포를 개선해 상위의 영주이며 규슈지역의 최강자인 사쓰마의 시마즈 가문에게 바쳤다. 철포는 곧 일본 전역으로 퍼졌다.
일본 통일을 눈 앞에 두고 부하에 배신당해 죽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철포대를 가장 잘 이용한 인물로 손꼽힌다. 열도의 패권을 결정한 나가시노 전투(1575)에서 노부나가군은 수적 열세에도 3열 철포대를 운용해 무적을 자랑하던 다케다 기마군단을 무너뜨렸다. 인도 고야의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만인의 철포는 종자도에 전래된지 불과 한 세대 만에 일본을 통일시켰다. 조선도 임진왜란에서 왜군의 철포에 녹아났다.
조선은 철포의 존재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 임진왜란보다 1년 앞서 대마도주가 조총 수삼정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과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에 나온다. 조선은 첨단무기를 어떻게 했을까. 군기시 창고에 처박았다. 활보다 연발 사격속도가 느리고 사정거리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붙였지만 조총이 박대 당한 진짜 이유는 왕을 비롯한 대신들이 발사음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각종 문헌에는 중국에 조총이 전래된 시기가 절강성에 침입한 왜구에게 노획한 1563년으로 나오지만 과연 그럴까. 일본에 앞서 유럽과 접촉한 중국이 화승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최소한 중국인 무역상 왕직은 화승총을 알 수 밖에 없었다. 남만인들의 무장이 뭔지도 모른 채 승선시켰을리 없을 테니까. 화승총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중국은 주목하지 않았다. 중화 중심주의에 빠져 선진과학기술을 오랑캐 문물로 얕잡아 본 것이다.
조선은 왜란을 겪고서야 조총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결국 당시로서는 양질의 개인화기를 만들어냈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제를 속오군제로 군제를 개편하면서 조총병의 비중도 크게 늘렸다. 1614년 후금과 싸우던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주로 출병한 조선군 1만 3,000여 병력 중에 조총병이 5,000명이었다. 중원을 차지한 청(후금)은 조선 조총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조총 무역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조선 조총병이 위명을 날린 적도 있다. 청의 요구에 따라 2차 나선정벌에 오른 조선군은 코자크 기병 위주의 러시아군을 거의 섬멸하는 승전을 거뒀다. 주목할 대목은 당시 러시아군은 신형 수석식 소총을 장비했다는 점. 화승총을 개량한 부싯돌 점화 장치를 장착한 수석식 소총은 화승총보다 발사속도가 빠르고 날씨가 아무리 습해도 발사할 수 있었다. 나선 정벌을 이끈 신유 장군은 노획한 수석식 소총을 모두 가져가려는 청나라에 사정에 단 한 정을 조선에 들여왔다. 조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 조정은 이번에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두 번에 걸쳐 신무기를 개발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서양의 화승총을 필사적으로 받아들인 종자도의 크기는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어째서 조선의 국왕과 조정 대신들은 섬나라 일본 중에서도 작은 섬의 도주보다도 판단력이 흐렸던 것일까. 화승총 국산화에 전력을 다했던 종자도에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발사기지가 들어섰다.
일본은 아무리 늦고 비싸도 무기나 첨단 제품은 반드시 국산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주 로켓도 그렇다. 일본이 대형 로켓 발사에서 미국·EU(유럽연합)와 경쟁하는 첨단 우주기지가 종자도에 위치한 게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거리에는 일제 차가 즐비하고 아이들의 필통에는 일제 문구가 가득하다. 청장년들은 양담배와 왜담배에 찌들어 있고…. 국산화하려는 의지도, 국산품을 신뢰하지 않는 풍토도 여전하다. 예나 지금이나.
/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