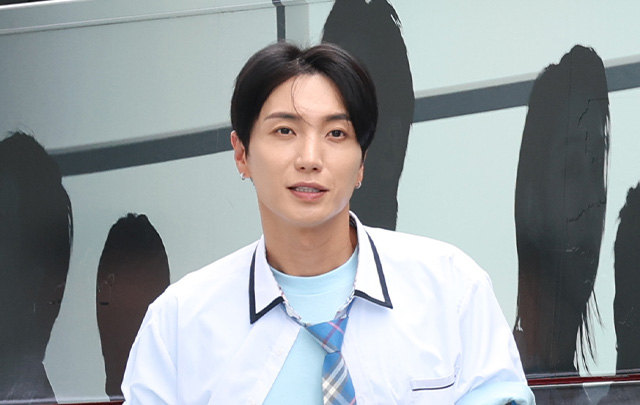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60주년이라고 다를 게 있나. 늘 한결같이 연기하는 거지.”
대배우에게 연기란 그저 일상의 연속이다. ‘~주년’이란 수식어가 의미가 없어진 지는 오래다. 철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을 보고 ‘연기도 예술적 창조행위가 될 수 있겠다’고 확신한 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배우의 길에 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60년. “연기란 오랜 시간 갈고 닦아 모양을 내야 하는, 완성할 수 없는 보석”이라 강조하는 배우 이순재(82·사진)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이하 ‘세일즈맨…’)의 연습이 한창인 서울 대학로 아르코극장에서 만났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현대인의 소외를 그린다. 외판원 윌리 로먼이 불황에 서서히 잠식당하면서 행복했던 과거로 도피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담았다.
“내 연기 활동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세일즈맨…’이에요.” 연기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서 실패한 가장이요, 낙오한 인간을 맡은 이유는 여기 있었다. 사실 이번 연극은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주도해 성사됐다. “오래 했다고 잔치할 생각은 없었는데 후배들이 ‘이왕이면 (작품)하나 하자’고 하더군요. 내 나름대로 중간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뭘 할까 고민했고 그러다가 ‘세일즈맨의 죽음’이 떠올랐죠.”
윌리 로먼 역은 이순재에게 이번이 네 번째다. 1978·2000년 고(故) 김의경 연출의 ‘세일즈맨…’에 출연했고 2012년엔 김명곤 연출이 원작을 한국화해 만든 ‘아버지’에서 주인공을 맡아 열연했다. “어느 연극인들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겠느냐마는 ‘세일즈맨…’은 ‘베케트’, ‘시라노’와 함께 내 스스로 ‘이만하면 열심히 만든 괜찮은 무대였다’고 평가하는 작품이에요. 물론 흥행도 했고요.”
배고팠던 시절, 그에게 첫 ‘출연료’를 안겨준 작품도 바로 1978년 공연한 ‘세일즈맨…’이다. 그만큼 연극판의 현실은 팍팍했다. 이순재는 “그전까지는 연기가 좋아 돈 한 푼 안 받고도 무대에 섰다”며 “당시 문화 선진국처럼 연기자가 ‘딴따라’가 아닌 예술가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생계를 위해 한번에 10편의 영화에 동시 출연하고 집에는 한 달에 일주일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일해도 아내가 만둣가게를 열어 돈을 벌어야 할 만큼 어려운 삶은 한동안 이어졌다. “하다 보니 유명해져서 돈을 번 것이지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장사꾼이지.” 매너리즘에 빠질 틈조차 없었다던 치열했던 나날과 연기에 대한 갈증은 지금의 대배우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섰던 그이기에 최근의 문화 검열 및 블랙리스트 이슈는 가슴이 아프다. “그런 명단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술가를 정치 성향으로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죠.” 예술계 내부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편 가르고 정권 따라 이득을 보겠다는 일부의 편향성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바른말은 하되 자기 전공 분야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 애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나는 시점을 정해두고 연기하지 않는다’는 이순재의 데뷔 60주년 기념극은 12월 13~22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배우 손숙이 그의 아내 린다 역을 맡아 호흡을 맞춘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