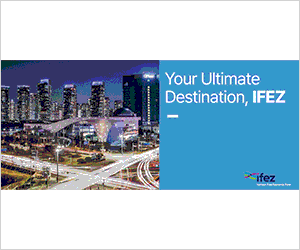“내 그림은 살 사람도 없지만 팔 생각은 더더구나 없다. 그림 일로 안색을 바꾸는 것도 싫고 돈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죽기보다 더 싫다. 차라리 한 끼를 굶는 것이 뱃속이 편하다.”
예술가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했다.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적 추상미술’을 개척한 화가 류경채(1920~1995) 또한 그랬고 유난히 더 꼬장꼬장했다. 그래서 류 화백은 생전에 상업화랑 개인전을 단 두 번밖에 열지 않았다. 예순셋이던 1983년 춘추화랑에서의 전시가 처음이었고 1990년 현대화랑에서의 전시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 “예술가라는 것은 순교자와 수도승과 같은 존재다. 남몰래 노력하고 남몰래 심혈을 바쳐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곧 예술이다”라고 한 그의 말은 지원금을 빌미로 예술가들을 고르고 옥죈 ‘블랙리스트’ 파문 속에서 더 애잔하게 울려 퍼진다. 하고 싶은 말을 색(色)에 담아 표현한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 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고 조각가 류훈과 류인을 낳아 길렀다. ‘류경채의 추상회화 1960-1995’전이 삼청로 현대화랑에서 오는 2월5일까지 열린다. (02)2287-3585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