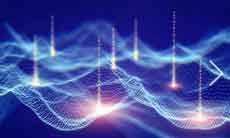한국은행이 13일 금리를 10개월 째 동결(1.25%)하기로 결정한 데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내외 상황을 반영했다. 최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이 총재와 위원들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보이며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금리동결은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금리를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정을 지키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1월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우리 안팎의 여건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로도 부족해 ‘초(超)불확실성 시대’라는 용어가 생겨났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소위 3가지 딜레마(트릴레마·trillemma)에 봉착했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 케어’가 무산됐다. 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잦아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올해 총 3회 금리를 높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1.25%)를 감안할 때 미국(0.5~0.75%)이 3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미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더 높은 수익을 노린 외화가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만약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는데 더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며 시중의 유동성을 더 빠르게 흡수하면 외화 유출은 더 빨라질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기준 금리를 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지자 가계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섰다간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 역시 어렵다. 한은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들의 이자상환 부담액이 9조원가량 늘어나고 0.1%포인트 뛰면 52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위험이 10% 넘게 높아진다. 섣불리 금리를 인상했다간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빚에 눌려 소비 여력이 떨어진 국민들이 지갑을 더 닫게 해 민간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