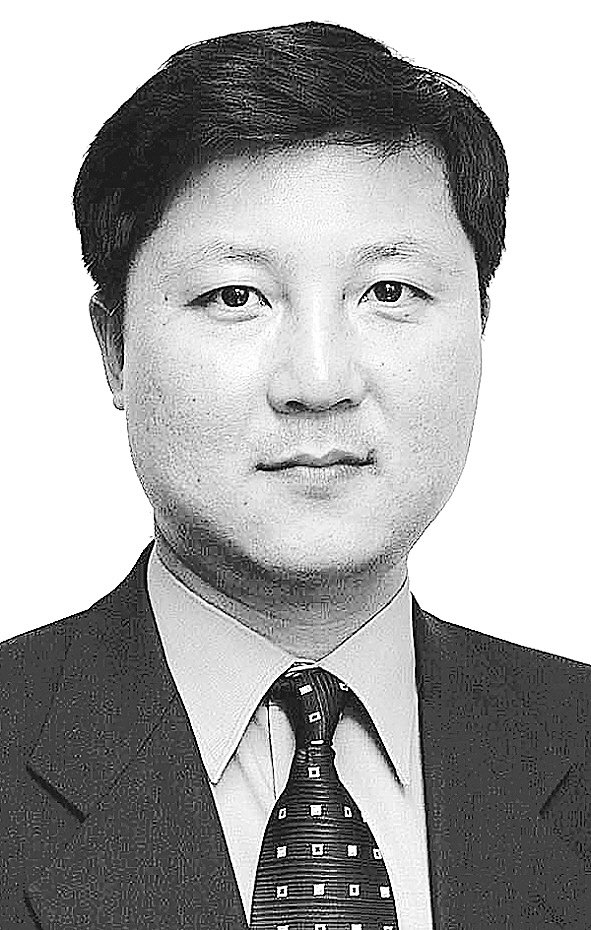정부는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무상’이라는 단어에 자꾸만 관심이 갔다. 무상은 바로 ‘공짜’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공짜는 ‘공짜나 바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 어감을 갖고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인 나는 정부로부터 공짜교육 혜택이나 받아야 하는, 다시 말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됐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부로부터 은전을 입었으니 마디만 한 뜻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부 언론이 지적하듯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이 하필 고3부터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에 유권자가 되는 고3이 학부모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음으로 진 빚을 표로 갚는 상상을 했을 법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들이 정부로부터 공짜교육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다. 적어도 고교교육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내가 정부에 눈곱만큼이라도 고마움을 느끼도록 부담을 안겨준 원인은 바로 무상이라는 단어에 있다. 무상은 사실 ‘의무’라는 단어로 대체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같은 듯 다른 말이다. 의무교육은 취학 의무를 전제로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며 무상교육은 취학의 강제 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의무교육 없이 무상교육은 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없이 의무교육은 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고교 진학률은 99.7%요, 대학진학률마저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이 정도면 당연히 법에 조항을 넣어 의무교육을 할 만한데 언젠가부터 무상교육 얘기만 들리고 의무교육은 자취를 감췄다. 의무교육이 되는 순간 정부는 국민을 무상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민은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어 하나 차이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마치 대단한 인심을 쓰는 일로 둔갑했다.
지난 2004년 출간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이런 경우를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아들 조지 W 부시는 2001년 대통령이 된 후 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의 반발을 의식해 ‘감세’라는 표현 대신 ‘세금 구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세금에서 구제해주겠다니 싫어할 사람은 없었고 민주당마저 ‘중산층을 위한 세금 구제안’을 내놓을 정도로 부시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2017년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아바타입니까”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을 때 게임은 끝난 것을 많은 사람은 기억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유권자의 기억에는 MB아바타가 아니라고 할수록 MB아바타만 남았다. 민간인 학살 대신 부수적 피해, 지구온난화 대신 기후변화, 자유로운 해고 대신 노동 유연성, 미분양분 대신 회사보유분이나 특별분양분, 버스요금 인상 대신 버스요금 현실화 등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프레임 전쟁이 우리 주위에서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은 나뿐일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 아닌 바에야 주문하는 데 굳이 남의 도움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자꾸만 주문을 도와주겠다니 나는 어느덧 별것도 아닌 주문조차 제대로 할 줄 몰라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사람이 됐다. 그냥 “주문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끝내 손님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
국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는 교육기본법 8조를 바꿔야 한다. 3년을 6년으로만 바꾸면 된다.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무상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hank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