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로 보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그’는 250살이다. 50·60대에는 심장병을 심하게 앓았지만 인공 심장 덕에 이제는 마라톤을 뛸 수 있다. 당뇨병도 100년 전쯤 인공췌장을 이식받아 완치됐다. 수명 다한 망막 세포를 컴퓨터 칩으로 교체한 덕에 자기 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첨단 기술에 고마워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로봇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열망한다. 고비를 겪을 때마다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 헤쳐왔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하나의 덫처럼 느껴진다. 죽음을 거의 걱정하지 않는 그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발달한 시대,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을 사는 미래 인간 ‘빅터’다.
불로초, 냉동인간, 인간 복제…불멸을 향한 인간 욕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 간절한 바람은 역사 기록과 수많은 소설·영화에 담겨왔다.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다양한 ‘불멸의 방법’은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 조금씩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과연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은 올 것인가. 신간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은 인공장기를 비롯한 융합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조망한다. 저자는 이 융합기술 발전이 초래할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 발전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선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에는 인간이 감당 못 할, 상상 못 할 변화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이런 시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미 늦은 숙제’일 뿐이다. 저자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에 직면할 질문을 미리 제기하고 그 대답을 강구한다. ‘오랜 수명을 누린 후 우리는 자기 뜻에 따라 인공장기의 작동을 멈출 수 있을까’, ‘인공장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인간은 더 행복해질까’, ‘인간을 강화하는 기술이 악용되거나 불평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저자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 즉 ‘트랜드 휴머니즘’으로 대표되는 인간 강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당 못 할 기술 발달의 속도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닌,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1만7,5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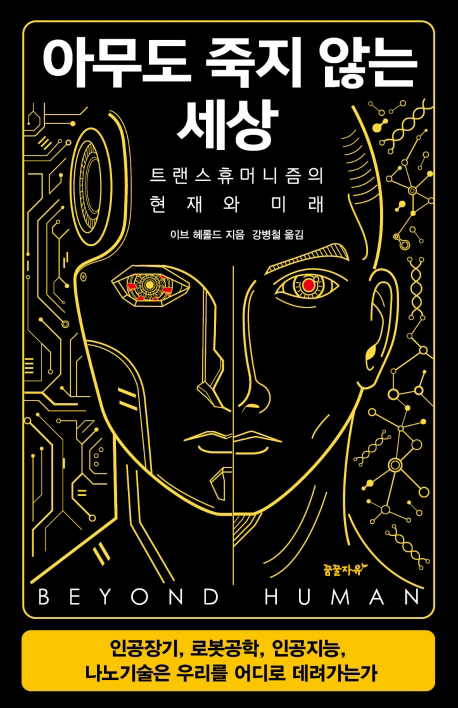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