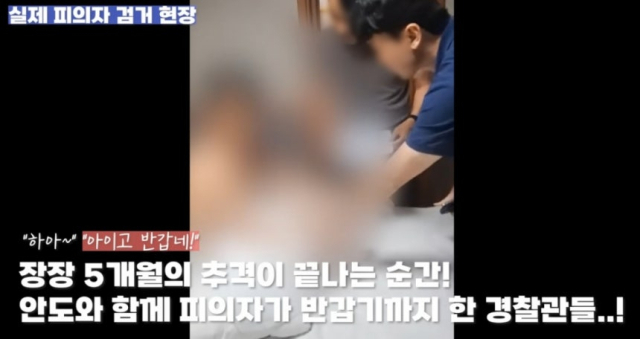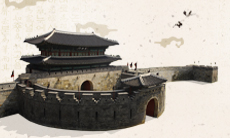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는 98.6%에 달한다. 전 세계 평균(63.7%)보다 훨씬 높다. 미국·유로존 등 선진국 평균(75.3%)을 웃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부채의 질도 나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27.6%포인트나 급등했다.
지급 기한이 1년 미만인 단기 부채 비중도 22.8%에 달한다. 2~11%가량인 유럽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한국의 가계 부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00.6%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726조 원에 달한다. 특히 1년 사이에 126조 원이나 불어났다.
가계 부채 급증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하자 3040세대는 대출 받아 집을 사는 ‘영끌’에, 2030세대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뛰어들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의 가계 빚도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은 선거를 의식해 가계 부채를 더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말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 추진을 약속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청년·무주택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 부채 급증은 적신호다. 금리 상승 등으로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채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늦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