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로 그린 ‘천지창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지만 오래 들여다 볼수록 더 많은 생각거리를 던진다. 그 중 하나가 손 내밀며 서로 닿으려는 아담과 신의 표정인데, 아담은 느긋하고 신이 오히려 심각하다. 미술사에서 널리 통용되는 분석은 아담의 순수한 표정과 편안한 자세가 그의 무지(無知)를 드러내는 것이며, 신은 애써 인간에게 다가가 이성과 지성, 도덕감정 같은 고귀한 것을 부여하고자 열의를 보인다는 것이다. 독일의 뮌헨 근교에 사는 정치철학자로, 도서관 못지 않게 미술관을 들락이는 저자는 포스터를 구입해 방에 걸어두고 탐닉했던 이 그림을 두고 무신론을 생각해 봤다. 특히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이야기 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개념에 대해 사유했다. “주인들의 도덕은 좋음(善)이 우선 존재하고, 거기에서 나쁨(惡)이 정의되는 순서다. 하지만 노예들은 반대다. 내가 느끼는 좋은 것에서 시작해 뭔가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가치가 외부로부터 파생됐다는 점이 자율적이지 못해 이름 붙은 ‘노예 도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는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은 단순한 무신론 선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쌓아온 인간 이성과 도덕률에 대한 묵직한 도전”이라며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허무주의를 극복하자는 사람이며 그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염세의 철학이 아니라 긍정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신간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은 철학자가 그림을 매개로 어려운 미술과 더 어려운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기에 특별하다. “철학과 미술의 공통점은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저자가 미술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 철학의 개념을 일상 언어로 이야기 했다. 이를 테면 쌓여 있는 책을 그리는 조선시대 ‘책거리’ 작품들에서 서양 원근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구도와 아찔한 긴장감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균형과 조화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를 떠올린다. 다양한 사상이 폭발적으로 만개하던 시절의 제자백가는 서로의 사상을 발전시키며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다.
구스타프 클림트에게 의뢰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천장화가 포르노그래피라는 혹평을 받은 사연부터 황홀한 가로등 불빛을 그린 자코모 발라의 그림에 숨겨진 ‘힘과 속도’에 대한 파괴성, 천진난만한 파울 클레의 작품이 파시즘의 광기를 뚫고 피어난 예술이라는 설명까지 미술작품에 관한 남다른 깊이의 생각을 따뜻하고 공감의 폭이 넓은 시선으로 풀어낸다. 1만8,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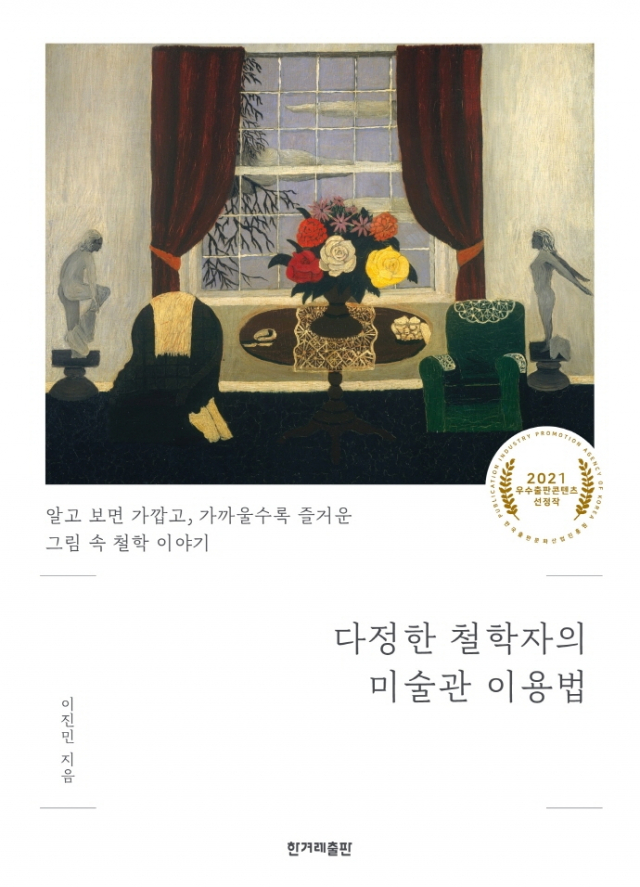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