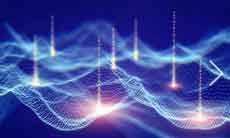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배출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인력 부족으로 전체 시설중 불과 13%만 확인했다.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해 방출하는 시설이 적발됐지만 환경부는 초과 배출 적발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곳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남 완도지역에서는 5곳의 소각시설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이 중 한 시설은 기준치의 90배 넘게 방출했다.
장 의원은 전체 시설 중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만 확인하는 환경부의 점검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시설 중 불과 12.8%만 점검해 900여곳의 다이옥신 배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 시설 당 8년에 한번 꼴로 점검하는 셈이다. 표본 추출도 주먹구구로 운영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고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6개월~2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체 점검도 무의미한 상황이다.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도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 측정 후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전남 1곳, 제주 1곳으로 등 4개 지자체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이 0건이었다.
솜방망이식 처벌도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이 적용된 시설은 단 3곳뿐이다.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뤄졌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사명을 변경 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