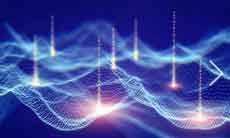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저번에 있던 사람은 물러터져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뻣뻣한 거야?” O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와 발밑으로 부서져내리는 몸의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 후배가 다가와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내가 준 영수증 계산 안 해봤어요? 밑에서 실수를 했으면 위에서 바로잡아줘야죠. 대리 성질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후배는 복화술을 하듯 입술을 조금만 움직였다.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 O는 양변기에 앉아서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간간이 물을 내렸다. 이런 환경에서 전임자가 그렇게 변해가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눈물을 닦는데 왼손 검지가 힘없이 부러졌다. (서유미, ‘당분간 인간’, 2012년 창비 펴냄)
서유미 작가의 소설에는 회사에 다니다가 신체가 변형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화사원의 신체 변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몸이 돌처럼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다가 결국 돌가루를 떨구며 다니게 되는 것, 그리고 몸이 흐물흐물해지다가 거의 물이 되어 바닥에 고이는 것. 돌이 되어도 물이 되어도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얼떨결에 취업했지만 회사에서 점점 돌이 되어가는 주인공은 계속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상사와 후배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도 도움받지도 못한다. 그는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아나선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직위와 자리에서 일했을 전임자다. 그러나 퇴사한 전임자는 돌이 되어가는 후임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자신도 물이 되어 방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몸이 부서지거나 흐물흐물해져가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장면은, 그런 이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다. 사람을 돌이나 물로 보는 사람들이다. 누군가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의 몸이 변하고 있다. /이연실 문학동네 편집팀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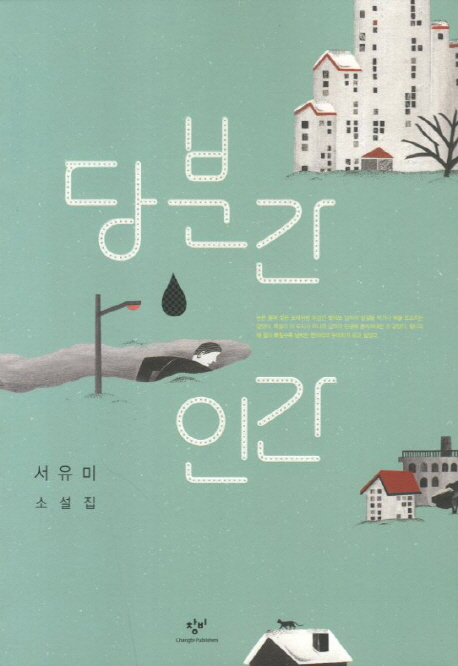

 yhchung@sedaily.com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