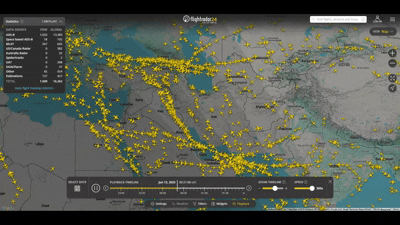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서울 관내 법원과 검찰 청사가 신축 이전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치했고 교대역 방면 안쪽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지검 앞의 분위기는 항상 북적이는 법원 앞과 사뭇 다르다. 비중 있는 인물의 출두·소환이라도 있는 날이면 언론부터 집회 군중까지 운집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안개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쥐 죽은 듯 고요해진다.
중앙지검 청사의 인상을 차지하는 그림 하나가 있다. 1층 로비의 동쪽 벽, 그러니까 정문을 들어서 출입 인증 후 고개를 들자마자 안쪽에서 어둑한 얼굴을 내미는 작품이다. 박서보의 1989년작 ‘묘법 No.890830’이다. 매끈한 회색 화강암 벽 위에 먹색 작품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그림이라기보다 발버둥에 가깝다. 올가미에 걸린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기 마련이다.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억울한 이라면 이 작품에서 탈출하려 애쓰는 인간의 절박함을 느낄지 모른다.
이 그림은 또한 집요함이다. 진위를 밝히고 진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표면 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헤집고 파헤친다. 들추고 팔수록 점점 더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동력이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적은 ‘검사 선서’가 그림 맞은편 벽에 걸려 있다.
감상자가 느끼는 발버둥과 집요함은 작가로부터 왔다. 박서보는 수행에 가까운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1970년대 한국 단색조 추상회화를 일컫는 ‘단색화’의 대표 작가다. ‘단색화’는 현재 국제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미술의 경향으로 꼽히기에 박 화백은 ‘살아있는 한국 현대미술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단색화’라는 이름은 당시 서양에서 한가지 색으로 그리는 ‘모노크롬(Monochrome)’ 회화가 성행한 까닭에 붙게 된 명칭이다. 1975년 일본 동경화랑에서 열린 5인전 ‘백색의 미학’이 부각된 것도 계기가 됐다. 하지만 박서보는 ‘단색화’의 진정한 의미로 “행위의 무목적성과 반복성”을 강조한다. 1960년대 말 어린 아들이 공책 칸에 맞춰 글씨를 쓰려는 게 번번이 실패하자 체념한 듯 종이 위에 연필을 마구 휘갈기는 ‘체념’의 몸짓을 봤다. 화가 아버지는 십 수년 찾아 헤매던 “비움을 화폭에 구현할 방법”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작된 ‘묘법(描法)’이다. 1970년대 초기 묘법은 일명 ‘연필 묘법’인데 캔버스에 칠한 희끄무레한 바탕색이 마르기 전에 연필 같은 것으로 재빨리 반복적으로 선을 그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완성해야 했기에 한 번 시작한 작업은 끝날 때까지 숨 막힐 듯한 반복을 요구한다.
중앙지검 로비의 그림은 1980년대 ‘중기 묘법’인 ‘지그재그 묘법’이다. “변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한다면 그 또한 추락한다”는 좌우명을 평생 새긴 작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했다. 한지라 불리는 우리 고유의 수제 닥종이를 물에 적셔 불린 다음 캔버스 위에 여러 겹 올렸다. 그 위에 물감을 칠한 다음 마르기 전에 긁어낸다. 찾아내려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의 절실한 몸짓이 그림에서 느껴진 까닭은 양 손가락으로 벽을 긁듯 일정한 길이와 간격을 이룬 선의 반복 때문이다. 이리저리 엇갈리는 지그재그는 어쩌면 삶의 진리일지 모른다.
박서보는 ‘지그재그 묘법’의 밑색으로 빨강·파랑 등의 색채를 사용하고 흰색에 가까운 미색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이 작품은 숯색에 가까운 먹색 위에 또 검정을 올려 어둠의 깊이감을 더했다. 색을 배제했기에 행위의 흔적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햇빛이 각도를 달리할 때면 검은 물감을 밀어내 뭉쳐놓은 별똥별 같은 덩어리가 찰나의 반짝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품이 걸린 데는 뒷얘기가 숨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을 지낸 박서보와 예술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다. 청와대를 둘러본 박서보는 곳곳에 걸린 작품들에 적잖이 실망했다고 한다.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은 당시 대한민국예술원 원장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대체가 예술적 안목이 너무 없다고, 여기 걸린 그림들이 국격에 맞느냐고 비판했는데 같이 앉았던 경호실장이 대화를 녹음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떠난 뒤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노재봉 씨와 관계자들이 ‘그 양반(박서보)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더라’면서 대화를 다시 들어봤대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없네’라며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했대요. 그러던 차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고검장으로 가면서 검찰 청사 이전을 준비하며 나를 부른 거예요. 벽에 맞춰 그림을 하나 해 달라고.”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이던 박서보는 총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작품 제안을 받았다. 긴장할 법도 한 상황이지만 외려 그는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원래 작품 예산으로 배정됐던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려 6000만 원을 받았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제작에만 3개월이 걸렸다.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 1989년 8월 30일에 완성했다. 캔버스 3개씩 4줄로 겹친 작품을 3폭이나 제작했으니 총 36점을 붙인 셈이다. 높이 3m, 폭은 6.8m로 벽 하나를 독차지했다. 관제엽서 기준의 호당 크기로는 1000호보다 훨씬 크다. 박서보 작품 중 최대다. 2018년 소더비 홍콩경매에서 박서보의 1970년대 중반 작품인 ‘묘법 No.37-75-76(195×300㎝)’이 약 200만 달러에 낙찰됐다. 지·금 환율로 약 28억 원인데 이곳 중앙지검의 작품은 압도적인 크기와 소장처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60억 원은 되고도 남음 직하다. 처음 그림 값의 100배다.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안쪽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쪽 벽은 김형근(92)의 폭 14m 대형 벽화 ‘진실, 소망(영원의 장 중에서)’이 차지하고 있다. 197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가다. 수상 이후로 주요 기관에서 벽화 의뢰를 많이 받기도 했다. 이 작품은 벌거벗은 사내아이들이 신선계의 이상향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담고 있다.
2층 엘리베이터홀 앞에서 만나는 이필언(81)의 ‘담-89’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추구한 작가의 철학이 잘 녹아 있다. 친근하게 봤음 직한 돌담에 농악패의 신명나는 한 마당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검어야 할 그림자지만 오방색 옷깃이 제 색으로 빛나 활기를 더한다. 돌담 아래로 뚫린 빗물 구멍까지 생생한 사실적 묘사가 놀랍다. 작가는 실체 없는 그림자를 통해 우리 정신성의 핵심인 ‘얼’을 그리고자 했다. 정신이 올곧게 살아 있는 곳이어야 함을 작품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