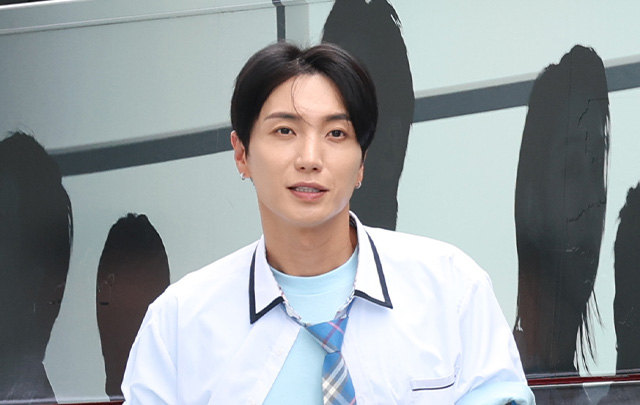미국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가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끝내 사망했고, 검찰은 해당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약 1200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어번데일에 있는 장기요양병원 ‘글렌 옥스 알츠하이머 특별케어센터’는 지난달 3일 여성 환자 A씨(66)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A씨는 같은 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시신 운구용 가방에 담긴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시 인근 머시 웨스크 레이크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그는 자가호흡 중이었으나 그 외 별다른 신체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달 5일 사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치매 초기 증상과 우울증세로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에 입원해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를 돌보던 병원 직원 B씨는 지난달 3일 새벽 “A씨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고 간호사에게 전달했고, A씨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의 사망 선고는 B씨가 간호사에게 A씨의 상황을 전달한지 약 90분이 지난 뒤였다.
간호사는 A씨가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뒤 사망 선고 약 5분 전까지도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은 직원과 또 다른 간호사 역시 A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측이 A씨 사망선고 이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1만달러(약 1230만원)를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ge@sedaily.com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