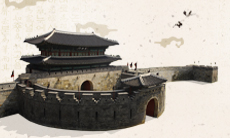예금보험이라는 용어는 대공황 이후 설립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기원한다. 세계 120여 개 예금보험 기구들 중 우리처럼 보험(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나라가 다수다. 하지만 일부는 보호(protection) 또는 보증(guarante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금융 서비스 보상’을 포괄하는 영국 예보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의 사례다. 이 독특한 명칭은 영국 예금보험공사의 다양한 기능에서 비롯됐다. 영국은 예금자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폭넓은 보호 및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금융 계약자들은 예금·증권·보험 등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 거래 예치금을 일정 한도까지 돌려받는 것은 물론 부적절한 자문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는다.
현대 금융정책은 전통적인 사업자 규제·감독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그중의 대표적인 하나다. 예금보험이 필요한 것은 예금자들이 정보와 지식에 취약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됐을 경우 예금자의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취약성은 예금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금보다 더욱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을 속속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방대한 설명서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 계약자의 취약성이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면 금융회사 파산 시 피해 보상이 예금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 예금을 넘어 보험과 투자로,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불완전판매와 부적절한 자문에 따른 손실까지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금융 계약자의 피해에 대한 공적 기구의 보상은 금융회사의 파산을 전제로 한다. 금융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라면 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피해 보상을 자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적 기구의 피해 보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향후 예금보험의 기능이 금융 계약자의 다양한 피해 보상으로 발전한다면 현재의 명칭도 변할 수 있다. 그 새로운 명칭은 금융계약보상제도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