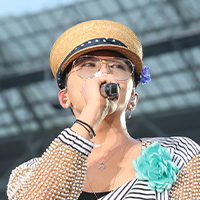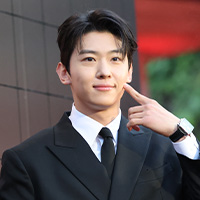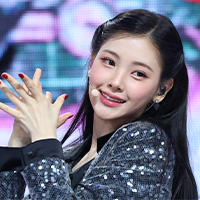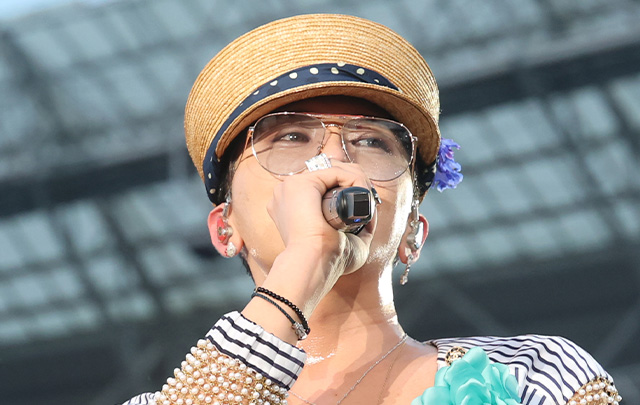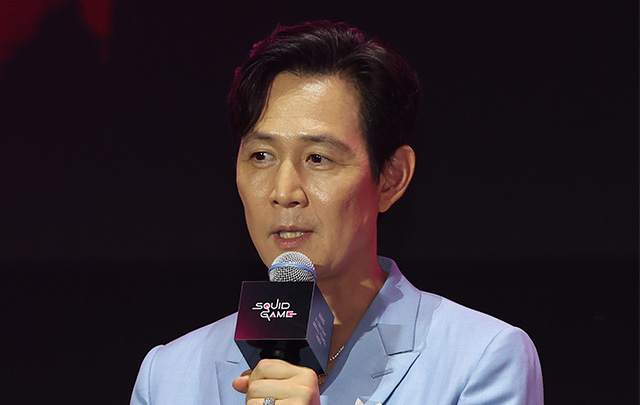고교학점제가 논란이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전면 도입한 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많아 일부 교원단체는 폐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도입한 시스템이니 우리도 익숙해지면 운영상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런데 초기 혼란을 딛고 안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개선일까 싶다.
우선 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과목을 깊게 배울 기회를 전면 차단하고 다수의 과목을 얕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 교과는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등 여러 과목 중 매 학기 선택 수강하는데 모든 과목이 한 학기로 끝난다. 학생들은 시험과 과제를 1단계 수준으로 마치고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과목을 또 1단계 수준으로 배우는 구조라 매 학기 모든 과목을 한 학기 분량의 1단계 수준만 성취하다 끝난다. 심화 과목조차 한 학기 분량이라 진도가 더 나가도 깊이를 길러낼 시간이 없다.
미국의 대학과목선이수제(AP) 프로그램은 한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 배우고, 국제바칼로레아(IB)는 네 학기 동안 심도 있게 진행한다. IB에서는 과목의 핵심 내용을 통합해 첫 학기에 1단계 수준으로 배우고, 두 번째 학기부터 네 번째 학기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를 갖는다. IB 학생들이 네 학기에 걸쳐 4단계 수준의 깊이 있는 역량을 기르는 동안 고교학점제하에서 우리 학생들은 매 학기 1단계 수준을 반복한다. 높은 산을 한 번이라도 오를 기회를 주지 않고 동네 언덕만 반복해서 오르다 끝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학생의 역량 증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사에게도 여러 과목을 준비하는 부담만 지울 뿐이다.
또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과목명이 바뀌어도 최종적으로 길러지는 능력은 변화가 없다. 예컨대 우리의 영어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모두 가르치고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말하기와 쓰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수능과 내신에서 1등급을 받아도 말하기와 쓰기가 여전히 편하지 않다.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목표 역량과 실제 평가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논술이나 탐구 과제를 늘리고 성취평가제를 한다고 하나 현재는 채점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관된 채점 기준이 교사의 평가권이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오해하는데 채점 기준이 불명확할수록 민원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의 평가권이 오히려 위축된다. IB는 전 세계 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시험 문항 유형별 표준화된 채점 기준을 명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오히려 날개를 달 수 있다.
요컨대 현 고교학점제는 영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피상적 수준의 반복 학습을 강제해 심층 학습을 막고,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각자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인공지능(AI)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역량을 기르지 못한다. 운영상 혼란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