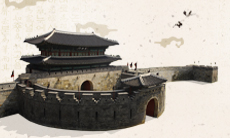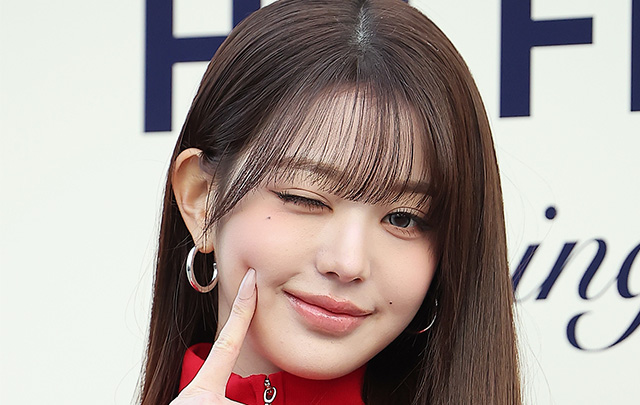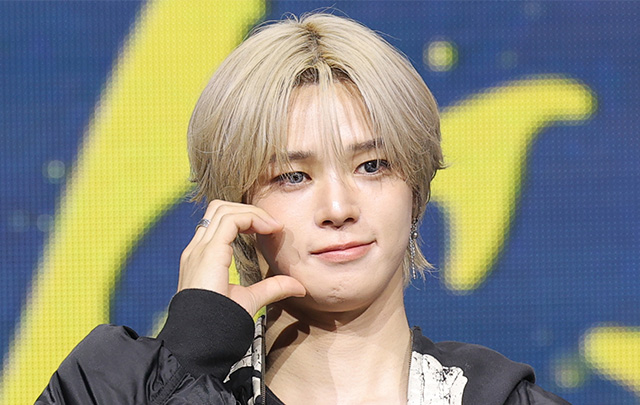지난해 한국의 커피 수입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개항기에 유입된 외래 기호품 커피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방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일이며 시험공부에 야근에 잠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던 일, 주말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일 등등. 이제 커피는 한국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민속’ 음료가 됐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에 이른다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이야기를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이 특별전으로 풀어냈던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런데 이러한 커피 공화국의 연대기를 충실히 재구성해보자는 박물관의 의도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믹스커피의 인기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널리 보급된 커피 자판기 실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때 그 시절 목 좋은 곳이면 어디라도 놓여 있던 그 자판기를 구할 수 없다니.
모름지기 민속이란 오랜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초들이 울고 웃으며 일군 삶의 모든 부면을 포함해야 할 터다. 가까운 과거의 애환을 담은 절절한 사연이 삼국이나 고려 시대의 그것들에 비해 가벼운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가까운 과거의 유물들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사연을 잘 담고 있어서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딸을 남녘으로 떠나보내며 어머니가 벗어 주었던 버선의 무게가 1000년이 넘은 고려 시대 유물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공공 박물관들은 근현대 유물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000년대부터 수집 범위를 현대 자료로 확대했고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아예 현대사 자료를 수집의 중심에 두고 있다. 또 지역의 공공 박물관들도 점차 해당 지역 현대사 자료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도 다가오고 있다. 수집 유물을 보관할 수장고 공간 부족 사태다. 이제 기증 의뢰가 들어와도 제때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박물관은 동서고금의 삼라만상을 수집해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진 수많은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살피는 곳이다. 수집의 너비와 깊이를 더할수록 이해의 수준도 넓고 깊어질 터. 학문이 발달한 나라들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공동체의 경험과 기억을 담은 유물을 수장하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이유다. 혹자는 전시도 하지 않는 유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무얼 하냐는 걱정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 박물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수장고는 더 이상 금단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021년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마련한 개방형 수장고 시설은 개방·공유·활용의 개념 위에 설계돼 ‘열린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에 관람객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 수장에 전시의 개념을 더한 멋진 시도다. 박물관의 모든 소장품을 대화면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호반응형 미디어월은 덤이다. 파주에 먼저 들어선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수장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수장고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섰다. 2031년 경기 북부권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우뚝 설 그곳이 기대된다. 이번 주말 헤이리에 가보는 건 어떨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