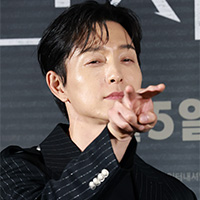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2월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니얼 퍼거슨은 이 경고를 ‘퍼거슨의 법칙’으로 재조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상환 비용이 군사력 유지 비용을 초과할 경우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칙을 미국에 적용했다. 후버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군사적 도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미국의 국가부채 이자 지급액은 국방비 지출액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자 지급액은 1조 1240억 달러, 국방비 지출은 1조 1070억 달러였다. 니얼 퍼거슨은 미국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방만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하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의 법칙과 유사하게 미국의 재정위기가 패권 위기로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마련했을까. ‘덜 쓰고, 더 걷고, 남에게 떠넘기기’다. 그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관세로 재정을 보전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관세 협상 전략과 함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대응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선심 공약을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skim@sedaily.com
hs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