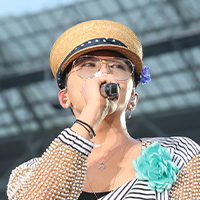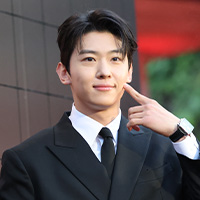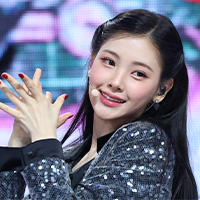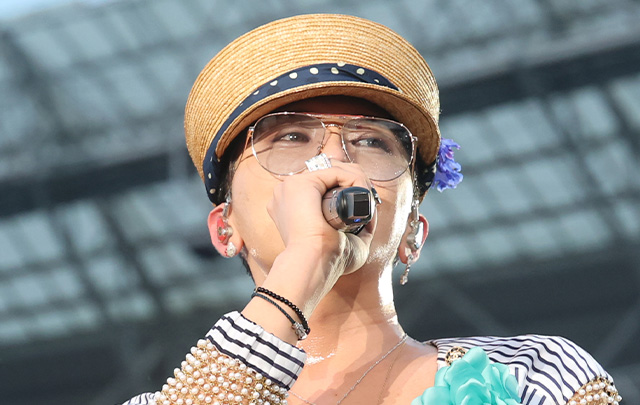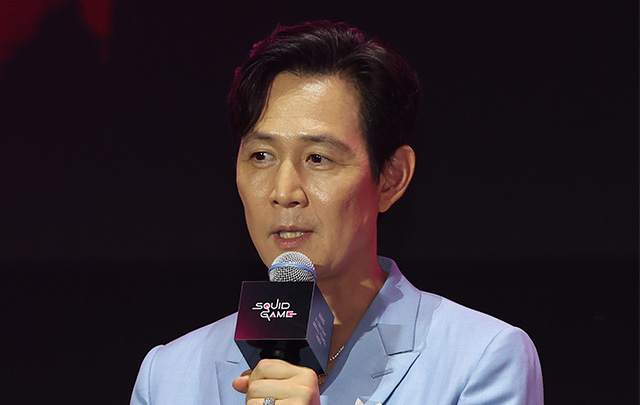서울 강동구의 70대 부부는 최근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렸다. 평생 키운 아들과 연을 끊은 것이다. 아들이 내연녀의 요구로 부모 명의의 집을 넘기려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막으려던 부모에게 폭력을 사주한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자식과의 법적 다툼을 사후까지 이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생전 설계’가 국내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언장, 신탁, 증여 등을 통해 미리 재산 분배를 정리하고 다툼의 불씨를 없애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펴낸 ‘2025 법무연감’에 따르면 전체 공증 건수는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유언 공증만은 예외다. 상속 분쟁이 늘면서 유언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법제연구원도 “유언 공증은 단순 서명이 아닌 공증인이 작성자의 판단력까지 확인해야 하기에 여전히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유언장 말고도,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유언 대용 신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언장과 비슷한 효과를 주되, 생전에 계약으로 자산 운용 방식을 확정해 사망 후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은 최근 1년 새 58%나 급증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미 일상적이다. 미국에서는 5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유언장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언장 작성 비율이 크게 올랐다. 반려동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산 처리 고민도 늘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유언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가족 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전혼 자녀와 재혼 자녀 간의 충돌, 배우자 간 갈등 등을 미리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기 성남의 김 모 씨는 유언장을 써두고도 자녀들과 함께 논의해 신탁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문서로 남겨야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태의 변호사는 “유언장은 사망 후 유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신탁은 생전 계약으로 실행되는 구조라 갈등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재산의 향방을 자산 소유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을 택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earthgir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