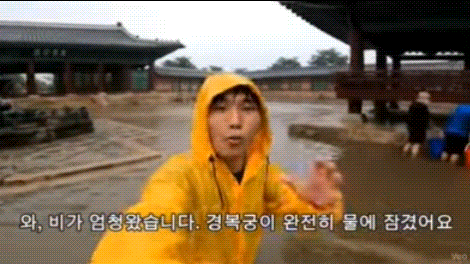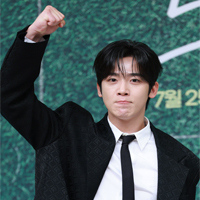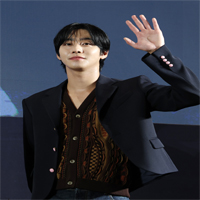회생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경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월수입란에 440만 원 상당의 안산시 소재 동물병원 급여만 기재했다. 그는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총 3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1억7427만원 중 7억3531만원을 면제받았다. 이에 A씨는 허위 재산 기재를 통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일부 감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고서가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가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나 각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수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