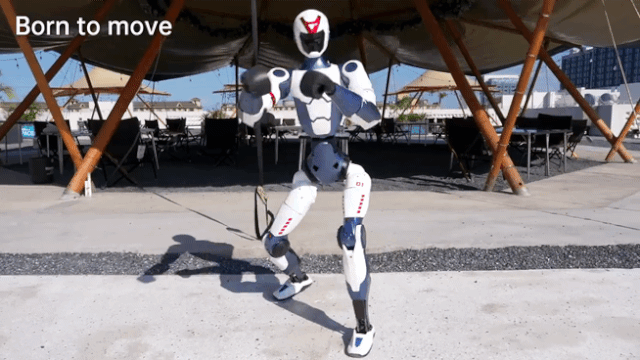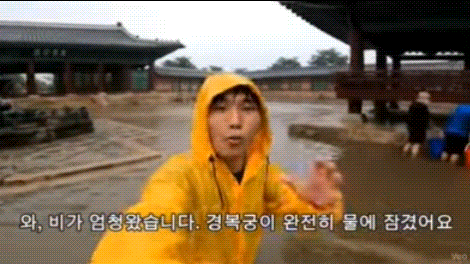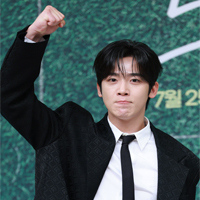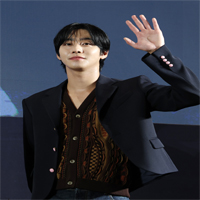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잡음과 논란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 독주와 오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다. 현행 87년 정치체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낳았고 독점적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다. 국정의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합의형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강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견제 수위를 높이고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복원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다. 기대와 희망만이 반영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