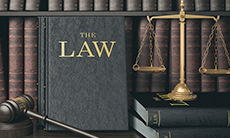빚 탕감 같은 채무 조정 정책에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무분별한 면책이 신용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하다. 이 같은 딜레마는 채무 조정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자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책 ‘목민심서’에서 가혹한 수탈로 파산한 농민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역설했다. 실제로 조선은 흉년이나 전란 이후 ‘결포면세(缺逋免稅)’ 같은 채무 경감 정책을 통해 백성의 재기를 도왔다.
민간도 마찬가지였다. 300여 년간 만석의 부를 유지한 경주 최씨 가문은 “만석 이상을 넘기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가훈을 지켜왔으며 “3년 이상 흉년이 들면 쌀을 풀고 빚을 탕감하라”는 원칙을 실천해왔다. 이는 부자의 도덕적 책무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려는 시대의 지혜였다.
도덕적 해이 논란의 본질은 누구에게 빚을 탕감해줄지에 달려 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와 ‘악의적인 상습 채무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이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책이다. 독일의 ‘성실 의무 이행 기간’ 제도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는 단순히 채무 감면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자기 책임(Skin in the Game)’을 내장시켜 도덕적 해이의 구조적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해당 기간 동안 진정성 있게 행동한 참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무성의한 이는 걸러지게 돼 있다.
채무 구제는 단지 빚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돼야 한다. 예컨대 직업훈련이나 공공 근로를 성실히 이수할 경우 추가적인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 구조가 절실하다.
최종 면책을 위해 금융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면 제도 설계 안에 행동경제학적 설득력과 심리적 유인을 정교하게 배치해야 한다.
추가로 채무 조정을 둘러싼 사회의 감정적 논란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무조건적인 용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배제도 정의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제받는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드러내고 사회가 그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제공하는 정교한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구제를 받는 이들 역시 성실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채무 조정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채무 조정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책임을 전제로 한 회복의 첫발이 돼야 하며 실수와 실패를 다시 일어설 자산으로 바꾸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구에게 빚을 줄여줄지 같은 과정보다 책임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권마다 채무 조정을 해왔고 논란도 지속돼왔다. 이제는 빚 탕감을 바라보는 시선과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그래야만 선의가 정의로 이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