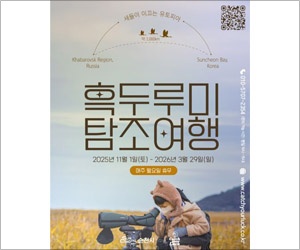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씌어져야 하는데 한국·일본 관계사도 마찬가지다. 박훈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가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를 내놓은 이유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가 변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넘어섰다. 혹자는 임진왜란 이후 400여 년 만에 일본을 앞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경제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본 조건은 된다. 정치와 문화 수준의 역전도 이뤄졌다. 저자는 책에서 “과거 세계 열강에 처참하게 능욕당했던 한국이 제국주의적 방법을 쓰지 않고도 ‘세계 열강’의 하나가 됐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도약에 가장 당황한 나라는 아마도 일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앞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악마화’한 데서 벗어나 한국의 잘잘못도 가리자고 한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도약은 19세기 말 일본의 도약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21세기 초반, 해방 후 처음으로 찾아온 고차방정식의 국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근대 일본은 단지 서구 열강의 외압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의 전환점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도약’에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도약’이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놓아두면 안된다.
저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대신 이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일본 근대사를 읽고 그 안에서 한국의 오늘과 미래를 되돌아본다.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표면적 화해를 넘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책은 전체적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속도감 있게 스토리를 뽑아 낸다. 책의 1부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길’은 미국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부터 메이지 유신의 완성까지를 다룬다. 일본이 외세의 충격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는지, 천황과 막부 사이의 권력 투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재편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어 2부 ‘19세기 한일 근대사의 명암’은 같은 시기를 살아간 조선과 일본의 선택과 결과를 비교한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성공했다.
3부 ‘20세기 일본사와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패망의 시기다. 잘 나가던 일본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와 전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 그리고 현재 한일 국민 간의 복잡미묘한 감정까지 다룬다.
책의 제목에 붙인 ‘한국인의 눈으로 본’이라는 수식어는 감정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썼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처지로서 일본 근대 정치를 한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때때로 나오는 저자의 의견은 역사를 더 다채롭게 바라볼 기회를 준다. 1만 98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