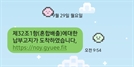관세와 규제를 무기로 민간기업과 다른 국가까지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겹쳐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고속 성장하자 패권 경쟁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이른바 ‘국가자본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자유화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반대로 미국 자본주의가 중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단행된 일련의 조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행정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고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통계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날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경제학자 E J 앤토니를 국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하며 BLS에 대한 장악을 선포했다. 자신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기존 미국 정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연방 도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인 워싱턴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바꾸고 필요시 군을 치안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청소년 갱단원들의 폭력 사건 등을 이유로 지목했지만 그동안 자치적으로 운영돼온 수도를 연방정부가 사실상 ‘접수’한 데 대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국가자본주의는 민간 부문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에게는 서슴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고 수출을 허용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트럼프가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을 탄압한 것과 꼭 닮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 CEO와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다음 주에 그가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대규모 투자 등의 협력을 요구했음을 시사했다.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에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수취’에 그치지 않고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의 최신 칩(블랙웰) 수출까지 허용할 의향을 시사하면서 국가 안보 침해 및 합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WSJ는 이 밖에도 US스틸 인수 허용 과정에서 일본제철에 요구한 ‘황금주식’, 미 국방부의 희토류 채굴 기업(MP머티리얼스) 지분 15% 인수 등도 중국을 모방한 행태라고 짚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주도 아래 고속 성장 중인 중국에 비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선호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선망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오랫동안 시진핑이 중국에 행사하는 통제를 부러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WSJ는 “국가가 민간보다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다”며 “국가자본주의에는 왜곡과 낭비, 연고주의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결국 독립적인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 적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버텨내는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pys@sedaily.com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