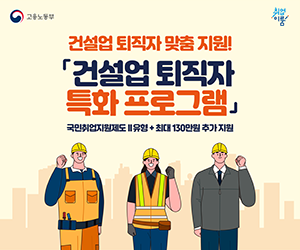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부실 PF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70곳으로 집계됐다. 6월 말(299곳) 대비 29곳 줄었고 4월 말(396곳)보다 126곳(31.8%)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부실 PF 규모는 9조 8904억 원(감정평가액 기준)에 달한다. 잔여 부실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성이 열악해 악성 PF로 분류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경·공매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량 사업장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부실 사업장으로 공개된 곳들이 매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PF 개선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연말 발표로 미뤘다. 건전성 방안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 대출한도 정비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의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식의 옥석 가리기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방안이 하루빨리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부실 사업장 정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보다 지방 PF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한 곳 중 수도권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4월 157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91곳으로 66곳(42.0%)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은 238곳에서 179곳으로 57곳(2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부실 PF 사업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정리 속도는 더욱 느리다. 지방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4월 전체의 58.4%에 달하는 139곳을 기록한 후 지난달 108곳으로 31곳(2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77곳에서 39곳으로 38곳(48.4%)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정리됐다. 한 중소 시행사 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계획된 주택 건설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했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친다”며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도 PF 자금 조달이 안돼 사업이 멈춘 곳들을 지원해 정상화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은 270곳 중 14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앞서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에 소속된 전문가·사업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PF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이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95%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가 ‘PF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답했다. 주택 사업자들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 다음으로 ‘막힌 브리지론과 PF시장 정상화’(22%)를 언급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ice89@sedaily.com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