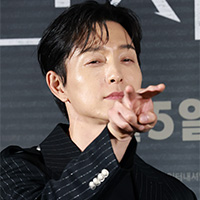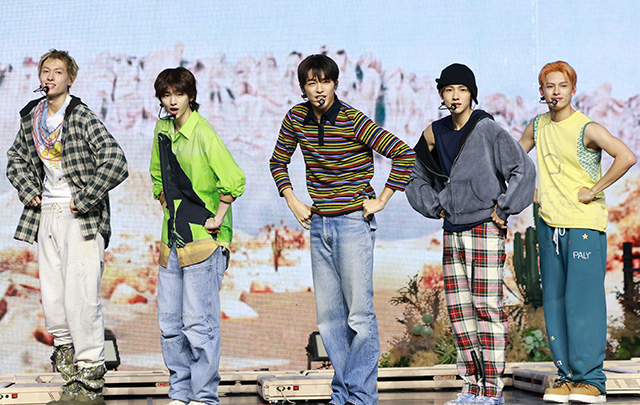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1972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의 원칙을 명시했다. 서독이 기존의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동독과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서독의 외교 전략을 말한다. 1955년 정책 발표 당시 외무 차관이던 발터 할슈타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과거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도 독일과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다가 1973년 6·23 선언으로 폐기하기에 이른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 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두 국가라는 실체는 인정하되 통일이 될 때까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북기본합의서 대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을 방침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남북 관계의 특수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한 동·서독 기본조약의 핵심 조항만 따른다면 민족 분단이 영구화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서독도 조약 체결 당시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북한 격변 사태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할 때 사회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