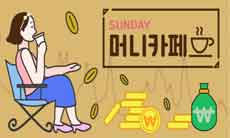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혼란한 틈에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결정하자 지주와 유통업자들이 쌀 부족을 예상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에 나선 결과였다. 가격 폭등으로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쌀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파동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데라우치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당시 일본 국왕 요시히토의 연호를 붙여 ‘다이쇼(大正) 쌀 파동’으로 불린 이 사건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시작하는 배경이 됐다.
일본이 올해 들어 쌀 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값이 올 5월 들어 5㎏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가 넘는 4200엔(약 4만 원) 수준까지 치솟자 ‘다이쇼 쌀 파동’에 빗대 ‘레이와(令和·나루히토 현 국왕의 연호) 쌀 파동’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일본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가격이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마트에서는 쌀 품귀 현상으로 ‘1가구 1포대’ 구매 제한이 걸렸고 한국에 온 일본 관광객들이 귀국길에 한국 쌀을 가득 싣고 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쌀값 폭등 소동을 겪은 일본은 지난달 50여 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팔리는 20㎏ 쌀 한 포대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넘었다. 전 세계 쌀값은 최근 하락 추세인데 쌀 농업 구조와 유통망이 비슷한 일본과 한국만 급등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가 가공용 쌀 5만 톤 공급 등 쌀값 안정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거세다.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면 유통 시장 개선과 정밀한 수급 예측은 물론 생산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농업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bm@sedaily.com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