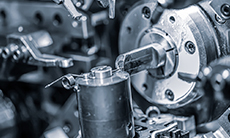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착공한다는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만 확대됐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90%에 이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포함되지 않고 공공·임대 중심인 탓에 공급 절벽 우려만 키웠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예고했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 없이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다간 수십 차례 대책에도 시장 내성만 키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는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적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 하지만 서울시 공급안의 실제 입주 시점은 2035년 이후로, 당장은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이 필요한데 이는 입법 사안이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게다가 정부는 용적률 추가 상향 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이다.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서울시와 국회·정부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과 서울시가 협력해야 한다. 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 주택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사업장 활성화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때만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깰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