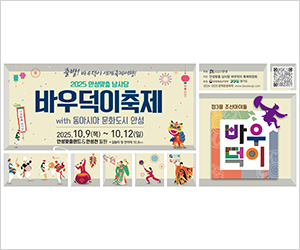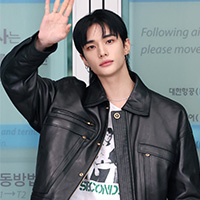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막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이 들어가지만 시장성이 떨어져 민간이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선경(사진) 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아희귀질환을 앓는 소수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남들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K-헬스미래추진단은 기존 R&D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 도전형 R&D’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연구 영역을 뒷받침한다. 추진단이 진행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헬스케어 분야에 9년간 1조 162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프로젝트 당 4~5년의 개발기간과 180억 원 가량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부 지원 사업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건이다. 선 단장은 “민간 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영역을 국가가 뚫어주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 나가는 구조가 한국형 ARPA-H의 지향점”이라며 “연구자·기업·정부·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 변화를 이끄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들의 키워드는 ‘희귀질환·AI·양자기술’이다. 소아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개발(N-of-1 임상시험)과 환자맞춤형 유전자치료, 고령화 사회에서 노쇠를 예방하는 AI 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 또 양자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 개발도 과제에 포함됐다. 선 단장은 “파격적인 지원조건이지만 이 정도로는 신약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다”며 “국가가 길을 터주면 이후 임상·사업화 단계는 민간 투자가 이어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혁신 도전형 연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인 만큼 장기간 뚝심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선 단장의 생각이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크해 만들었다. 선 단장은 “미 고등연구계획국 관계자는 성공 비결로 ‘‘DARPA 문화’를 꼽았다”며 “70여년간 각국이 미국의 DARPA를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만 유일하게 성과를 낸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선 단장은 “달성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난제에 도전하는 만큼 연구자들이 안주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세분화해 ‘마일스톤’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유”라고 말했다. 마일스톤 점검 방식은 PM(프로젝트 관리자)이 중간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방향을 조정하거나 중단까지 결정하는 체계다. “지원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끝까지 관리하는 구조”라는 게 선 단장의 설명이다.
선 단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R&D예산 전략에 따른 인력 누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대폭 삭감하자 연구자들이 유럽·중국 등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이 이들과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며 “추진단은 유럽 9개국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외 한인 연구자들을 글로벌 협력의 접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yj@sedaily.com
sy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