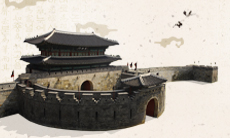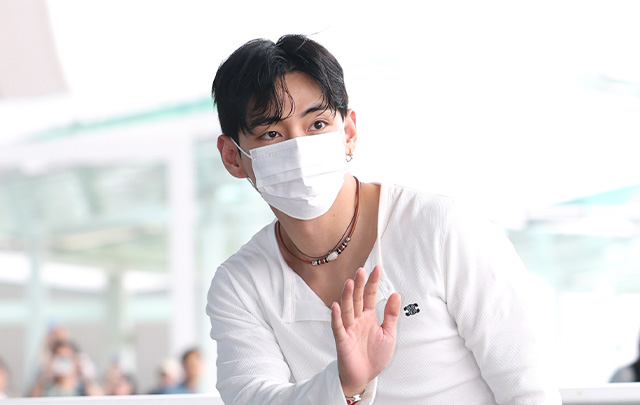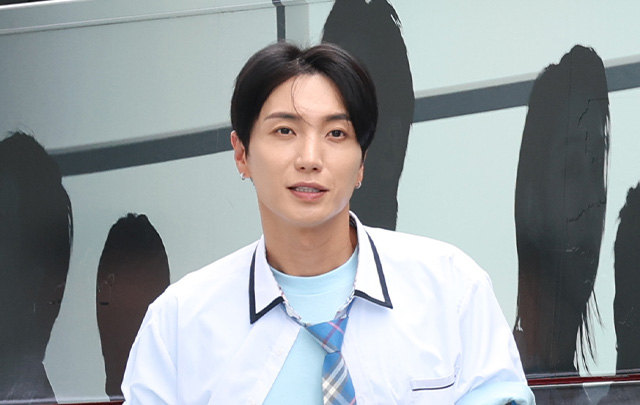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위시한 그 어떤 국가의 식품안전규제 기관도 음식 속의 머리카락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FDA는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식품 속 이물질을 자연적 혹은 피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머리카락은 여기에도 빠져있다.
게다가 지금껏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음식, 혹은 음식 속의 머리카락을 먹고 건강이 나빠졌다는 보고가 접수된 적도 없다. 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피부과 전문의 마리아 콜라빈센조 박사는 이런 이유로 머리카락이 빠진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간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고밀도의 단백질로 이뤄져 있다"며 "이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머리카락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이 달라붙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머리카락 한두 개에 붙어있는 정도의 포도상구균으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
건강상의 이상을 유발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머리카락 전부를 먹어야 한다는 게 콜라빈센조 박사의 분석이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 식품회사들이 케라틴 속의 아미노산인 L-시스테인을 활용, 밀가루 반죽을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이 인공합성했거나 오리털에서 추출한 L-시스테인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사람 머리카락에서 L-시스테인을 얻는다. 물론 추출 전에 머리카락을 염산에 담가 살균하므로 위생상의 문제는 없다.
이처럼 음식의 맛을 돋우는 머리카락 추출물이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스파게티에 달라붙은 머리카락과 맞닥뜨리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다. 하지만 스파게티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러운 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FDA는 스파게티를 요리할 때 쓰는 토마토소스의 캔 속에서 구더기가 나와도 두 마리까지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