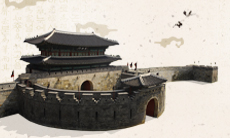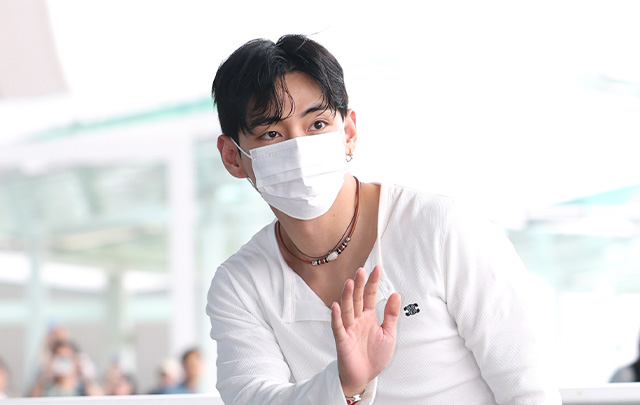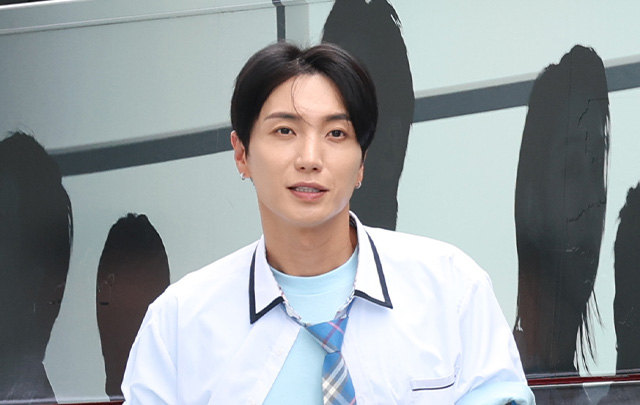태양 에너지 보일러와 하수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했고 옥상에 정원도 만들었다. 하지만 힘든 일도 많았다. 배송트럭이 주택의 뼈대로 쓸 재활용 가능한 발포재 패널을 부수기도 했고 부실공사 때문에 창문 시공사를 고소하려고도 했다.
내달 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다. 친환경주택 건설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경험자로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popsci.com/green dream에서 존 B. 카넷의 작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장점과 위험성
이상 : 재활용 가능 단열 발포재 패널로 만든 손쉽게 설치 가능한 조립식 프레임
현실: 일부 패널의 파손과 절단 실수로 공사 지연 유발
목재 프레임은 단열성이 떨어지고 재단과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구성과 보온성을 겸비한 조립식 단열 패널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프로젝트에 쓰인 패널은 경량 스틸스터드와 재활용 가능한 발포폴리스티렌 수지로 이뤄져 있다.
폴리스티렌 수지 속에는 흑연이 함유돼 있어 열을 가두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 필자는 이 패널을 주택용으로 구입한 최초의 고객이었기에 공급업체였던 라이트십 그룹은 일처리에 다소 허점을 보였다. 배송과정에서 패널 일부가 손상됐고 몇몇 패널은 제단이 잘못되어 주택의 철제 지지 빔에 맞지 않았다.
물론 이 회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료로 패널 교환과 수리인력 파견을 해줬다. 하지만 패널 설치에 8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어 총 14일이 걸렸지만 훌륭한 고객서비스 덕분에 더 큰 낭패는 면했다.
#2: 시공사에 대한 사전 확인
이상: 효율적이고 멋진 알루미늄 문과 창문
현실: 문과 창틀의 미완성, 그리고 변호사 비용
필자는 이 주택이 현대적 아름다움과 시골의 투박함을 겸비했으면 했다. 그래서 현대식 알루미늄 창틀과 100년 묵은 향나무로 된 목재 외장재를 선택했다. 알루미늄 창틀은 자칫 단열성 하락의 우려가 있고 침실 3개의 주택에 시공하면 시공비만 14만 달러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맞춤형 삼중유리 알루미늄 창문과 문을 6만 달러에 시공해주겠다는 업체를 찾아냈다. 이 회사의 프레임은 특수 단열 기술을 채용, 비닐 소재보다 단열 효과가 50%나 우수했다. 그만큼 냉난방비 절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기술과 달리 이 회사의 시공기술은 볼품없었다.
지금도 주택에 문과 일부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비닐로 가려져 있고 설치된 창문조차 빗물을 제대로 막지 못해 플라스틱판을 덧대 놓았다. 문은 나무문을 구입해 해결했지만 창 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건식 벽체 설치도 미뤄지고 있다. 맞춤형 제품 구입시에는 시공사의 능력을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DIY의 한계 인식
이상: 직접 만든 온수용 태양열 집열기 설치
현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도 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고가의 모델을 제외한 채 태양열 집열기를 선택하던 중 필자는 아예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막상 시도해 보니 DIY보다는 상용제품의 구입이 더 나음을 깨달았다. 직접 만든 시제품으로는 겨울철에 이 주택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를 채울 만큼 많은 온수를 생산할 수 없었던 것.
결국 필자는 상용제품을 다시 구매해야 했다. 기성품은 설치도 쉽고 외관도 깔끔하다. 친환경 주택 건설은 상당 부분 생소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이 좋다.
#4: 투철한 예산 관리
이상: 지열정 통한 냉난방비 절감
현실: 예산 부족으로 하나의 지열정만 뚫었다
필자는 당초 두 개의 지열정을 가진 1만6,800달러 규모의 지열시스템을 계획했다. 이 시스템은 항상 10℃를 유지하는 지하의 온도로 주택을 냉난방한다. 태양전지 패널이 제 능력을 발휘 못하는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부족에 부딪히면서 지열정을 하나만 뚫어 7,000달러를 절감했다. 이렇게 시스템 크기가 작아진 만큼 지열 의존도를 낮춰야 했고 2층의 바닥을 복사열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바꿨다. 예산상 도입 여력이 안 되는 친환경 기술을 무리하게 채용하려 하기 보다는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