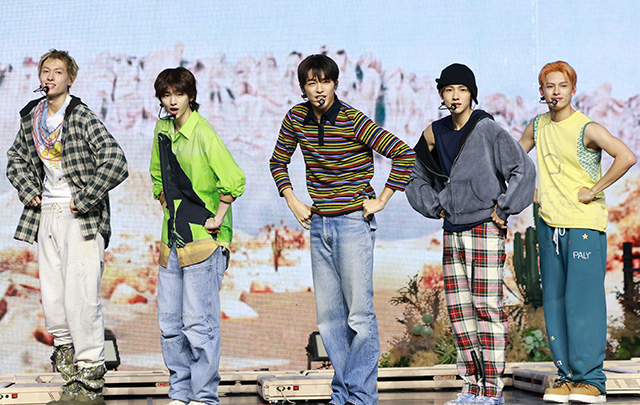러시아는 7일 미국·유럽연합(EU)산 농산물·식품 등의 수입을 1년간 금지한 데 이어 자동차·조선·항공기 수입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EU가 금융제재를 비롯해 무기수출 금지와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의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러시아 측이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혀 대(對)서방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의 무역보복으로 나타날 경제적 악영향을 걱정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맞불은) 결국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서방국과 러시아가 으르렁대는 사이 중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경제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무차별 적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액정표시장치(LCD)·분유에서 자동차·정보기술(IT)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깃이 된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EU 업체들이지만 우리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목된다. 현대차가 현지에 론칭할 신차의 가격인하를 추진하고 카톡·라인 등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중국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등 벌써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강대국 대립에는 정치·군사적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경제 무기화로 집약되기 마련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민족주의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세력을 얻어가고 미국 역시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대외무역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경제전쟁이야말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정경분리 윈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