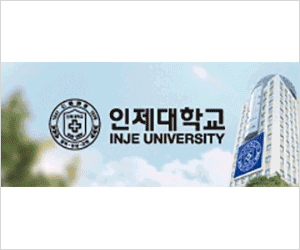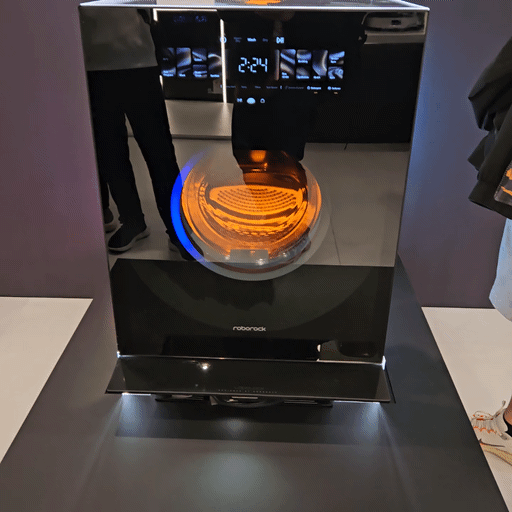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스크 칼럼] 현실을 무시한 대가
입력2007-07-09 17:25:04
수정
2007.07.09 17:25:04
이젠 제발 잠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달리 올해도 여지없이 ‘노사 갈등과 마찰’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갈등의 전개 과정이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을 손도 대지 못한 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무척 괴롭다.
재벌그룹이라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고 중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덩치가 커진 이랜드그룹이 계열로 거느리고 있는 홈에버ㆍ뉴코아 등 유통매장 13곳에서 노사 문제(정확하게는 비정규직 처리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문제의 발단은 ‘2년 임기’를 꽉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리 때문이다. 새로 마련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전환시킬 형편이 못 되면 해고해야 한다.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의 경영 부담을 이겨내기 힘겨워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비록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적인 기대치에 부응하느라 최근 잇달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속속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썩 개운한 표정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두 갈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고도 해당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고용하면 된다. 이 경우 신분에 변화가 발생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뿐이다. 또 다른 선택은 해당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하면 된다.
이랜드그룹은 임기가 꽉 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두 갈래의 선택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사회 분위기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당장 사회적 눈총은 받겠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랜드그룹의 유통업체 매장들은 지금과 같은 홍역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한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두 갈래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집었을 뿐이다. 비록 비정규직 신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회사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매몰차다’고 할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보자면 회사가 두 갈래 선택 가운데 보다 ‘유리한 카드’를 선택했다고 실력 행사를 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본바탕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가장 큰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2년 정도 했다는 것은 개인 노하우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동시에 회사 역시 그 같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법제화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인간애가 넘친다.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기업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과 맞느냐는 점은 별개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일거리 자체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이랜드 사태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비정규직이라는 일거리 자체는 어찌 보면 ‘시대와 경제환경’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다. 비용을 무한정 치를 수 없는 기업과 맘에 드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시장의 거래원리에 맞춰 그럭저럭 이정도면 된다는 선에서 합의한 접점이다. 이 접점을 놓고 한쪽에서는 ‘처음부터 힘이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부당한 결과물’이라며 부정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원리를 모르는 소치’라고 일축해왔다.
어찌 됐건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다른 형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마찰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칼은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운신을 오히려 제약하는 존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법의 당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효과만 끝없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합의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용기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