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은 핵심산업의 경쟁력이 ‘비상벨’을 울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태라고 진단한다.
전자·자동차·화학 등 주력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에서 차세대 산업을 내놓지 못한 채로 몇 년만 더 어물대면 국가 경쟁력이 이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를 내세웠던 국내 조선 산업은 급부상하는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수주잔량 기준으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준 지 이미 오래고 최근에는 17년 만에 일본보다도 남은 일감 규모가 적어졌다.
6일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연초 기준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수주잔량은 1,98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중국(3,064만CGT), 일본(2,006만CGT)에 이어 3위로 밀렸다. “인도량이 많아 수주잔량 감소 폭이 컸을 뿐”이라는 우리나라 조선 업계의 자기 위안도 이제는 안 통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추격 속도도 아찔하다. 실제로 지난해 인도 바룬사(社)가 발주한 VLGC(초대형 LPG 운반선) 수주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들었지만 최종 낙찰은 중국 장난 조선소에 돌아갔다.
또 다른 주력산업인 자동차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2%(10만대)가량 줄었고 미국 수출물량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격 대비 성능 우위를 앞세운 중국 중한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600’이 국내에 상륙해 내수시장을 장악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하는 반도체 업계도 결코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堀起)’를 목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약 1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한국이 장악한 시장에 비집고 들어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업체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초대형 인수합병(M&A)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핵심인재를 빼내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러브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한 번 밀리기 시작한 국내 주력산업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계열사 사장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전략을 짜면 여기에 막대한 투자재원을 집중 투입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국내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삼성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로 기술력을 따라잡아 더 우월한 상품을 내놓은 뒤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쟁에서 한 발짝이라도 뒤처지면 융합 플랫폼을 통째로 놓치게 돼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관·재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팀플레이’를 펼치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국내는 산업주체 3곳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드론 하나 날릴 공간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대선주자들과 중국과 미국의 반덤핑 규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빌미로 한 압박 등을 지켜보면서도 내 일처럼 나서지 않는 관료 등이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다. 기업들은 올해 정권교체 이후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할 때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변화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 및 세제 측면에서 기업 친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일범·한재영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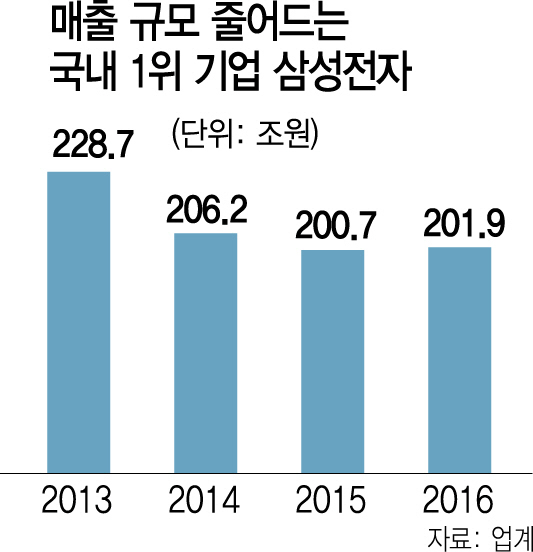
 squiz@sedaily.com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