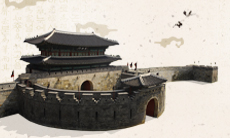일본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4조7,303억달러, IMF 기준)의 230%에 달할 정도로 나랏빚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살림살이도 늘 빚에 의존하는데, 가계라면 딱 파산했을 구조다. 그런데 요즘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취업희망자들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경제가 살아났다.
그 비결은 뭘까. 지난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이라는 ‘세 가지 화살’을 갖춘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상품·서비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감히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37→29.7%)와 소비세 인상(5→8%)에 나섰다. 임금인상 기업에 법인세 공제혜택을 늘리며 매년 관제춘투(정부주도 임금투쟁)도 벌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베가 국수주의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공분을 사고 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오는 2019년까지 실현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비중 40%) 임금 80% 달성, 잔업상한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과감히 재정확대 등을 펴는 것은 나라 빚(채권)을 내도 현지 금융사들이 95%가량을 초저금리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인구도 1억2,670만여명으로 내수기반이 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잃어버린 20년’ 기간 복지보다는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에 연륙교를 놓는다든지 경제예산 비중이 크고, 국가부채도 내부에서 소화가 되기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 대비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예산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기조하에 내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며 △신규사업과 출연사업 관리강화 △보조사업 전면점검 △수혜자중심 융합예산 △융자사업 관리개선 △과세기반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 소장은 “개발시대처럼 여전히 기업지원이 과도해 한계·좀비기업이 유지되며 생산적 구조조정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경제 분야와 융자 분야를 줄이고 공공부문 사회투자를 위한 재량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 예산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대기업·한계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좀비기업 방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부문 개혁, 공평과세에 나서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국가채무가 일본이나 미국·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라며 “4대강사업 같은 SOC와 경제예산 등을 줄이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미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2년 133조원이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국가채무)은 올해 지난해보다 44조7,000억원이 늘어난 682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40%를 넘길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본다. 해외에 비해 비중이 큰 공기업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1,433조원으로 전년보다 140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2조원 늘어난 752조원에 달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 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2016년)’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152%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독일이 2009년 채무준칙을 도입하는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원 발굴, 사회지출 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내려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페이고(Pay as you go)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이다. 실제 복지지출과 고령화 현상을 일찍 맞이해 나랏빚이 많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993년 발효한 마스트리흐트조약(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각각 GDP의 3%와 60% 넘으면 안 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이 크고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 과실이 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며 지출 효율화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감시 기능 강화, 형평성 있는 세제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영철 교수는 “영국은 재정안정화법을 통해 경상비나 소비성 지출은 엄격히 규제하지만 경제발전이나 미래 생산성 향상에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한다”며 “미국처럼 페이고를 도입하면 복지지출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 신축적인 재정정책이 힘들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황이면 세수가 넉넉해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불황이면 오히려 지출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이나 국방 등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할 게 많다”며 “교육부의 경우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 안 따라오면 돈을 안 주는 식인데 BK(Brain Korea)사업만 해도 학교가 아닌 교수별로 줘야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보텀업(Bottom up)에서 전략사업에 대해 총량을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을 발굴하는 톱다운(Top down)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사 강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심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복지·일자리 등 포용적 성장 조건
·경제예산 감축과 미래대비 투자확대
·정부지출 효율화 등 예산 구조개혁
·국회와 시민 예산 감시기능 강화
·형평성있는 세제개혁 국민적 공감대
·재정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