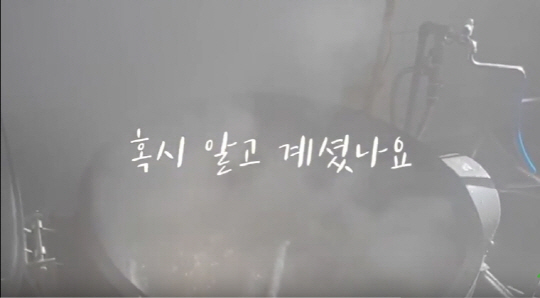| [영상]“우린 ‘밥 하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입니다” |
지난 14일 국회 ‘학교급식 노동자와의 대화’에서 급식 조리사의 실태를 밝힌 이윤희 씨는 “긴 장화에 앞치마, 모자에 마스크까지 하고 전이나 튀김을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다”며 업무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또 “급식실에 와서 앞치마 입고 체험 한 번 해보라. 1시간만 바라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얼마나 위험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급식 조리사 파업’으로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들의 업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조리사들을 둘러싸고 ‘정규직화’, ‘높은 보수’ 등 다양한 논란거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배치 기준’과 안전이 담보된 ‘업무 환경’이다. 업무 환경을 들여다보면 조리사 한 사람이 맡는 학생 인원은 약 150명 정도다. 약 3~4시간 동안 만들어야 하는 음식은 정해져 있고 한 사람당 1시간에 약 40~50인분을 해내야 하는 셈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무작정 뛰어들 수밖에 없다.
조리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거나 있어도 음식 온도를 위해 멀리 떨어 뜨려 놓아야 해 열중증(‘열사병’보다 심한 수준의 질병. ‘고온장애’라고도 부른다)에 시달리는 조리사들도 많다. 17년째 급식을 배식한 이 모씨는 “여름이 되면 급식실에 소금이 든 물을 배치해 둔다. 옛날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던 공장에나 있을 법한 소금물 통이 말이다. 그 정도로 많은 땀을 흘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단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열중증을 유발하는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한 열사병 예방지수(WBGT)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란 신분 때문에 지원도 거의 미비하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50대 급식 조리사가 900명 분의 닭죽을 준비하다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분쇄기에 손을 넣다 손가락이 잘린 조리사도, 구멍 난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다 화상을 입은 조리사도 모두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실제 산재 처리를 받을 확률은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좀 더 여유로운 배치기준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해봐도 전국 시도교육청 배치기준 상 급식노동자 1명이 150여명을 감당하도록 배치돼 있단 입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 조리사 김 씨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인다는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울음으로 밥을 짓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밥 하는 아줌마’, ‘허드렛일 하는 사람’쯤으로 치부되며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급식 조리사들. 이제 이들은 폭염을 대비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수립하고 살인적인 배치 기준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