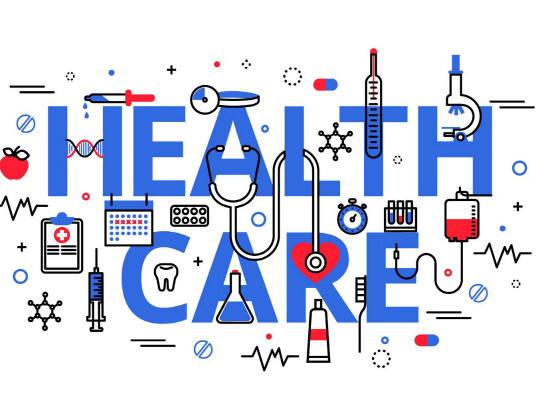추석 연휴 끝 무렵, 필자는 급성알러지 증상으로 입원을 했다. 병원 ’환자경험관리‘에 대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터라 실제 입원을 해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직접 체험한 병원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선 달라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추석 이후 앓아 누웠던 게 지난주 토요일부터입니다. 발열과 오한, 두통과 근육통, 그리고 피부 두드러기까지 무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도 가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혹독한 고통 속에서 보내다 드디어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복약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알러지 증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내린 결론은 입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매월 연재 중인 기명칼럼이라 한 달 건너뛰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지끈지끈 아프던 머리가 살짝 개운해져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쓸까 고민하다 ‘입원한 김에 병원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환자경험관리‘에 대한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차제에 직접 환자가 되었으니 이 참에 그에 관한 글을 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무척이나 까칠하게 말입니다.
먼저 환자복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입어야 하는 게 환자복입니다. 위생 유지,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치료 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 안 입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복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좀 전까지 멀쩡히 병원에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던 사람도 이 놈의 환자복만 입으면 영락없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율성, 즉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무력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 있는 모 양로원의 실험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스탭들이 전 일과 모든 활동을 다 도와주게 한 그룹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하게끔 한 그룹을 비교해보니 전자 그룹은 매사에 무기력한 반면 후자 그룹은 늘 활기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병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몰개성적이고 환경순응적인 환자복을 환자들에게 강요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백 번 양보해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환자가 아이들이라면 더 우울합니다. 이런 환자복을 입고 온통 무채색인 병원에 며칠간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그게 외려 또 다른 병을 부르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의료진의 진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떠올리는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걸친 의사의 모습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때로는 과도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병원에선 편안한 복장을 통해 환자들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의료진의 진찰복에 남습니다.
식사는 또 어떤가요? 병원은 환자에게 원하는 식단을 묻지 않습니다. 협의란 없습니다. 일방적인 공지만 있을 뿐입니다. 7시반, 12시 반, 5시 반이란 식사시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놓은 법칙인가요?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원하지도 않는 시간대에 억지로 먹으려니 모래를 씹는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었습니다만 이렇게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거의 전방위적인 방향에서 어마어마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환자경험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거나 관리상의 효율 때문이라 강변하는 분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저 혼자 그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병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의료진은 천편일률적인 하얀색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응급처치나 수술이 진행되는 현장이 아니라면 알록달록 색감이 들어간 옷도 상관없습니다. 디자인도 일반 의사 가운보단 훨씬 환자 친화적입니다. 전문가적 카리스마를 뽐내기보단 공감과 배려의 이미지를 수용한 친근한 디자인입니다. 환자복 역시 주어진 디자인 중에서 환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소아병동 쪽은 웬만한 테마파크가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병원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이 정도면 ‘병원으로 소풍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리 닦는 스파이더맨은 또 어떤가요? 스파이더맨이 내가 입원해있는 병원 외부유리를 닦아줍니다. 알고 보면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청소부 아저씨들의 진심이 담긴 즐겁고 유쾌한 복장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일반 호텔이나 식당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무조건 만족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그리는 병원에선 유명 셰프들이 매끼 유기농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줍니다. 병원 반경 300km 이내 최고 재료만을 공수해 만든 환자식을 저녁 메뉴로 제공해주는 겁니다. 병원 식사시간도 기다려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 경영이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앞에 ‘상상’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상상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 현재 많은 외국 병원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독일의 릴랙스앤스마일치과에선 의료진들이 실제 전통 민속의상을 입고 진료를 해 환자들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습니다. 유리를 닦는 스파이더맨은 미국 피츠버그 어린이병원, 호주 멜버른 왕립 어린이병원 같은 세계 각지의 웬만한 어린이병원에선 이미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도 실재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입원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치유될 수 돕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 중 하나”라는 스탠포드 대학병원 최고경영자 마르타 마시의 말은 환자경험이란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제 입원 나흘째입니다. 아파서 찾게 된 병원이지만 우리나라 병원 입원실의 모든 풍경은 환자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의료는 시설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세심한 서비스 디자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환자의 ‘병’을 뛰어넘어 환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병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를 웃게 하라’는 경영철학으로 유명한 카메 신스케 일본 마케다 의료원 원장의 말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습니다. 억울하면 안 아플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병원 관계자 분들께 이것 하나만큼은 꼭 묻고 십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게 최선입니까?”
안병민 대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헬싱키경제대학원 MBA를 마쳤다. (주)대홍기획 마케팅전략연구소,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 마케팅본부를 거쳐 (주)휴넷의 마케팅이사(CMO)로 고객행복 관리에 열정을 쏟았다. 지금은 열린비즈랩 대표로 경영·마케팅 연구·강의와 자문·집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 <마케팅 리스타트>, <경영일탈-정답은 많다>, 감수서로 <샤오미처럼>이 있다.
글_안병익 대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