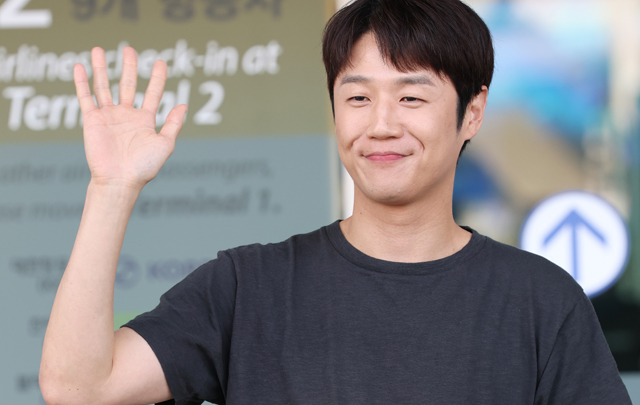1400년대 잉카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80%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400년 뒤인 미국 남북전쟁 시기보다 더 높은 수치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치료하는 천두술 같은 뇌수술이 기원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은 수술 흔적이 남아있는 두개골 등을 통해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미국 마이애미대학 신경과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는 지금의 페루 지역에서 발굴된 640명의 뇌수술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를 신경의학 저널 ‘월드 뉴로서저리(World Neurosurgery)’ 최신호에 공개했다.
고대의 두부 절개술은 주로 머리 부상 때문에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깨진 두개골 뼈를 제거하고 두개 내압을 완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외상성 부상이 없는 두개골 또한 수술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두통이나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팀은 △페루 남부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400~200년 두개골 59개 △페루 중부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1000~1400년대 추정 두개골 421개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1400년 초~1500년대 중반의 두개골 160개를 각각 분석했다.
두개골 수술 부위에 치유된 흔적이 없으면 수술을 받다 사망하거나 수술 뒤 회복하지 못하고 곧바로 숨진 것으로 간주했다. 수술을 위해 자른 두개골 부위가 매끄러우면 수술 후에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생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 결과, 생존율은 기원전 그룹에서는 40% 정도였지만 이후 53%로 늘고, 잉카제국 시기에는 75~83%에 달했다. 특히 북부 고원지대에서 추가로 발굴된 1000~1300년대 추정 9개 두개골 주인의 생존율은 91%에 달했다.
뇌수술 기술도 시간에 따라 점점 더 발전하면서 두개골 절개 부위가 작아지고 정교해졌다. 그 결과 뇌를 보호하는 ‘경막’ 손상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여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예측됐다. 몇몇 두개골은 뇌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흔적이 있었으며, 잉카시대의 한 두개골에선 5차례나 수술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남북전쟁 당시의 의료기록과 비교했다. 그 결과, 남북전쟁 때 뇌수술 사망률은 46~56%에 달해 잉카제국 때 17~25%의 두 배에 달했다. 남북전쟁 당시 야전병원 의사들도 머리를 다친 군인을 치료할 때 잉카제국의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두개골을 절개해 깨진 뼈를 제거하고 두개 내압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전쟁 당시 머리 부상은 대부분 총탄이나 포탄에 의한 것인데다 야전병원의 위생상태나 치료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치료술의 우열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보스턴대학 신경외과 전문의 에마누엘라 비넬로는 이와 관련, 사이언스지와의 회견에서 남북전쟁과 잉카제국 때의 두뇌 부상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잉카제국 때의 두부 절개술 생존율은 “놀라운 것이며, 이는 잉카문명이 이룩한 결과”라고 찬사를 보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