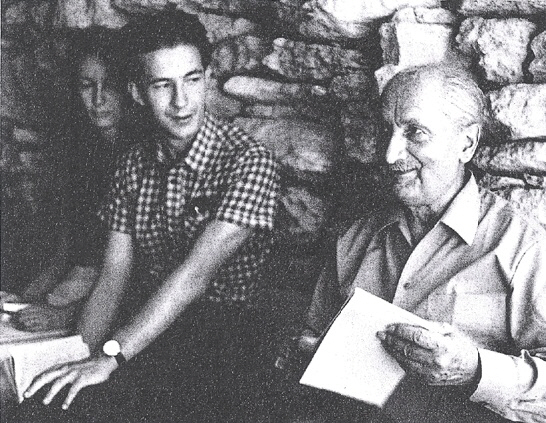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두 가지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다. 하나는 “학문은 생각하지 않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이다. 앞의 말은 오직 뒷말을 통해서만 이해된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학자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학자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단지 ‘계산’하는 지적 활동을 뜻한다. 그것은 사리를 분별하고 따지는 활동이자 자신이 창안한 가설을 정당화하는 지적 활동이다. 학문적 사유의 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확보되는 현실 장악력을 말한다.이런 차원의 생각이란 자연과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적 이성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머리 좋은 똑똑이라 불리는 이들의 생각이며, 그런 생각의 산물이 바로 지식이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을까. 지식과 구별되는 지혜는 무엇일까. 하이데거는 감사의 생각을 꼽고 있다. 심지어 감사에서 유래된 생각이 생각의 본령이라 말한다. 일단 그는 어원에서 실마리를 잡는다. 독일어에서 ‘생각하다’의 뎅켄(Denken)과 ‘감사하다’의 당켄(Danken)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을 것이라 추정한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싱크(think)와 생크(thank)가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여도 아직 감사와 생각의 연결고리는 막연하다.
언제 우리는 생각할까. 옛 철학자들은 ‘존재의 경이’를 느끼고 난 다음이라고 말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없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떠오르면서 생각은 시작된다. 무엇인가 놀라움을 야기하는 것이 주어진다. 그 앞에서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다가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위 ‘지적 자극’이 이런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존재의 주인이 아닌 이상, 그저 있는 것은 모두 ‘주어진(given) 것’이다. 선물(gift)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해야 한다. 주어진 것을 선물로 간주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싶을 때, 그때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논의 전개가 조금 억지스럽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통상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주어진 것이 모두 좋은 것일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선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조금만 성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선물이 뇌물로 판명되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새옹지마’ 같은 고사성어가 알려주듯이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으로 뒤바뀔 수 있다. 선물은 파르마콘(pharmakon), 즉 약이면서 독이다. 주어진 것이 워낙 형편없게 보인다면 쉽게 선물이라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선물로 여겨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주어진 것의 의미를 묻는 데 사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경구, ‘고통으로부터의 배움’을 이해할 수 있다. 도저히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숙한다. 새해가 되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결코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프로메테우스의 선물을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하고 코카서스 암벽에 묶여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실제로 불은 유익하기도 해를 끼치기도 한다. 불이 상징하는 기술과 이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천이자, 동시에 핵무기로 대표되는 인류 멸종의 잠재적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불 말고도 인간에게 준 것이 더 있다. 그것도 일종의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하나는 인간이 가련한 자기운명을 알 수 없게 해주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희망을 품고 살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운명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희망, 과연 이것은 인간에게 약일까 독일까. 여기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이 ‘아는 게 힘’이라는 금언을 이긴다. 아무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파르마콘을 선사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답해 보자. 대체 왜 글을 써야 할까. 감사할 게 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하고픈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렇게 여기기까지의 오랜 숙고가 요구된다. 글은 그 고된 숙고의 산물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때 비로소 값진 글이 탄생한다. 보통 책의 처음이나 끝에 ‘감사의 글’이라는 게 붙어 있다. 책을 쓸 때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책이라는 것 자체가 실상은 거기 언급된 존재자들 전체에 대한 감사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나 지식인들은 동시대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한때는 TV를 원흉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컴퓨터·인터넷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데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는 식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기껏 손익계산하는 생각만 횡횡한다. 그러나 계산하는 ‘나’ 역시 주어진 것이라면, 감사는 인간의 불가피한 운명이다. 요컨대 호모사피엔스는 존재에 감사하는 동물이다. 무한한 우주와 생명 탄생의 전 과정을 회고하며, 그 망망대해에 한 점으로 떠 있는 자기 자신의 주어짐에 감사하는 동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