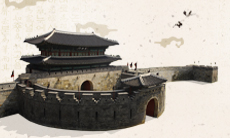반도체 산업의 미세화 난도가 높아지고 대규모 공장 가동이 필수적이 되면서 안정적인 공업용수와 전력 확보는 기업들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됐다. 공업용수는 미세한 불순물이 제품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최신 반도체 공장(팹)에서 사용하는 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팹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확보하는 일 또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0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서로 ‘원 팀’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종 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권한이 정부에 있는 탓에 동향 파악을 전달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업용수 수급 문제는 환경부, 전력 수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초동단계다. 공업용수·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모른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의 한 실무 관계자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전체 사업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20조 원이 투입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용인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000660))도 하루 26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기업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다가 1년 6개월을 허비했다. 삼성전자(005930) 또한 평택캠퍼스에서 지자체와 송전탑 갈등을 무려 5년이나 끌며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용수·전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해법이 뚜렷하지 않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대 규모에 달하는 데다 최첨단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 만큼 사용할 물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사용될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는 국내 산업단지 전체를 놓고 봐도 최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기준 연간 1억 6366만 톤의 용수를 사용했는데 이는 용인 클러스터의 연간 추정 사용량인 2억 3725만 톤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공업용수의 핵심 취수원 중 하나로 꼽힌 팔당댐에 대해 환경부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혔고 각 지자체마다 산단 유치를 위해 용수를 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 재이용 등 다방면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각 지자체가 얼마나 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체를 숨기고 있다”며 “경기·충청권에 접한 산업단지가 많은데 아무리 국가 핵심 사업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을 제치고 먼저 자원을 끌어가겠다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일 최대 전력 사용량 7GW는 국내 모든 발전소 총발전 용량인 약 138GW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을 꾸리고 “연내 전력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 능력이 포화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송전탑을 건설해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국내 송·배전망 공급을 맡은 한전이 최악의 재무 위기를 겪고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국가는 지금 반도체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반도체 강국은 역사책 속에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산업단지 구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무부처에 사업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줘 통합된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눈치를 보기 때문”이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