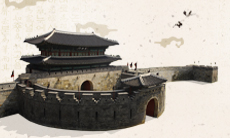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 중국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중국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발간한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근본적 리스크는 민간·공공의 과도한 채무 부담보다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펜 월드 테이블(PW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2015~2019년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요소를 제외한 기술개발, 혁신역량 등 보이지 않는 요인이 창출하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노동생산성 또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와 달리 추세적 하락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자립경제 전략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총생산(GDP) 대비 수입액(수입비중)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부터의 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평균적으로 수입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중국의 민간·공공부문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점, 중국의 우호국(러시아·이란·북한 등)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한국·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중국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비중 축소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강제적 비중 축소는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상품·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돼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회에 계류된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