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은 보수적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아돌프 티에르는 1872년 이 같이 선언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화주의’는 가장 덜 분열적인 틀이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유권자들도 보수주의에 힘을 실었다. 1869년부터 1933년까지 64년 간 미국 정치 역사를 보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48년, 상원을 56년, 하원을 32년간 차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보수주의는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았다.
‘자유주의(2014년)’를 출간해 반향을 일으켰던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정치 전문 기자 에드먼드 포셋이 이번에는 ‘보수주의 : 전통을 위한 싸움’로 돌아왔다. 미국에서는 2020년 출간됐다. 스스로를 자유주의 좌파라고 정의하는 포셋이지만 768쪽에 달하는 분량에 프랑스·영국·독일·미국의 보수주의 역사는 물론 숨겨진 사상가들까지 꽉꽉 채워 담았다.
숨 가쁘게 달려 책을 덮고 나면 보수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 한 가지가 남는다.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대나무처럼 올곧은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보수주의자들은 휘어지더라도 유연하게 자신들을 변형시켜왔다.
왕정이 무너지고 계급적, 문화적 위계가 평등해지는 근대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첫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유민주주의가 내거는 ‘평등’ ‘정의’ 등의 가치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배척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주류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에 맞춰 자신들의 이론과 이상을 재정비했다. 계급의 위계 구조는 사회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단일 국가, 단일 국민의 프레임으로 전환됐다. 오늘날 보수주의가 이민 배척으로 흐르고 일부의 경우 포퓰리즘, 전체주의의 가능성이 생기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재산권 보호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됐다. 처음에는 신진 세력인 산업과 무역, 금융에 맞서 대지주의 토지 자본을 대변하는 방식을 고수했지만 이후 산업과 무역 금융이 중심 세력이 되자 이들 모두를 대변하는 한편 점차 모든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확장했다.
포셋은 자유주의 좌파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토록 똑똑하다면 어째서 책임을 맡지 못하는가. 자유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존중을 약속하지만 평등한 존중의 범위와 내용이 막연하다보니 보수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유권자들은 약속의 이행에 대해 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약속을 믿기 보다는 실행력의 차원에서 보수주의를 선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브라이언 거빈은 ‘20세기의 우파’에서 민주적 우파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극단주의자들이 파고 들어 민심을 호도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 가운데 주목할 인물은 영국에서 세 차례 총리를 지낸 스탠리 볼드윈이다. 역사적으로는 저평가됐지만 국민 통합과 공통의 가치, 계급의 무차별을 내세우며 보수주의를 영국 중산층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만들었다. 보수당으로서 행동력도 갖춰 연금 체계 정비, 슬럼가 정리와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회 개혁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우파가 분열되고 독일에서 나치당처럼 파괴적인 극단주의자가 활개를 칠 때 영국은 안전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한 세기가 흘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세력은 강경 우파다. 미국 공화당의 주류 세력도 강경 우파다. 강경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결함과 이행되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의 약속을 파고들어 유권자 사이에서 암덩어리처럼 자라난다. 결국 온건한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위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보수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다시 짚어볼 기회다. 4만2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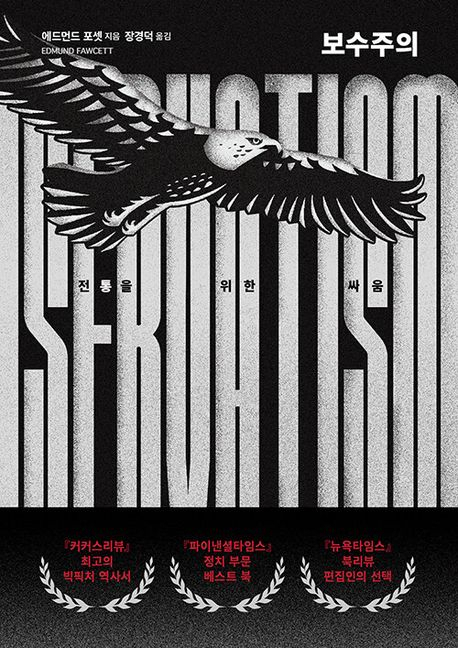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