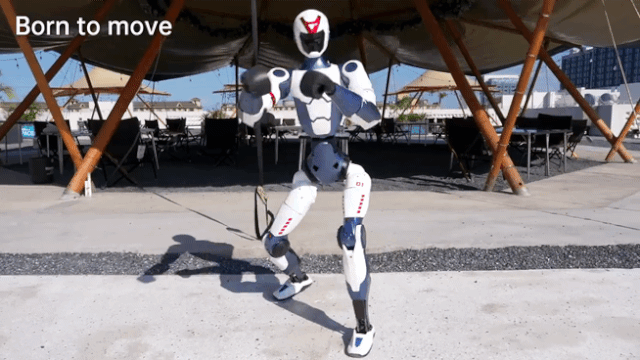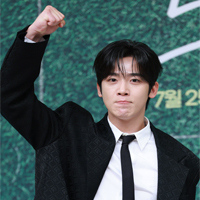금융연구원이 부동산 대출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에 대한 한도규제를 제시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간접적인 관리를 넘어 총량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의미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지나친 관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부동산 관련 금융을 취급하긴 하지만 가장 취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전체 대출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의 합이 전체 대출자산의 50%, 그중에서도 부동산 PF 신용공여의 합은 전체 대출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 중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직접적인 신용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로 설정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도 과도한 부동산 쏠림 문제의식 느끼고 대대적인 구조개선을 펼치는 가운데 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실제 2010년대 중반 이후 은행의 총 기업대출 대비 부동산업 및 건설업 여신의 비중을 보면 2017년 23%에서 2023년 25%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며 정책 제언과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책 영향력이 상당한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실제 '부동산 대출 총량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각 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종 비율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관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간접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관리책을 짜는 상황이다. 당국은 현재 15% 수준인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높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ero@sedaily.com
ze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