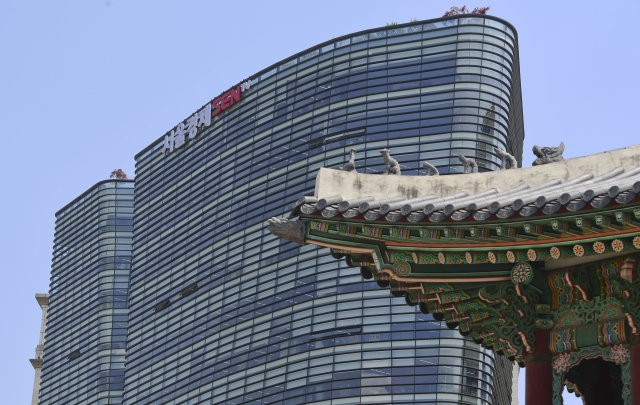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바이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토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이끌어야 할 2000여 개의 비상장사들은 최근 투자금 고갈로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바이오 투자 자금이 마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높아진 상장 문턱이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평가기관 2곳의 기술성 평가에서 ‘A·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기관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기보다 당장의 사업성 평가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많다. 피노바이오의 경우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임상에도 진입했으나 기술성 평가에서 세 번이나 탈락했다.
어렵게 기술성 평가 문턱을 넘더라도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도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지난해 6개, 올 상반기 4개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공개(IPO)로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어려워지니 바이오 비상장사 전체의 투자 유치 난도가 높아졌다. 기업이나 신약 후보 물질 단위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한 해외 투자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IPO가 거의 유일한 엑시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제약·바이오 투자를 활성화해 바이오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6대 첨단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케어를 꼽기도 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특화 펀드 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바이오 기업 상장이 막혀 투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태”라며 “이러한 구조를 타개하지 않으면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