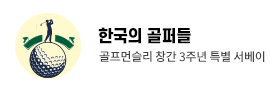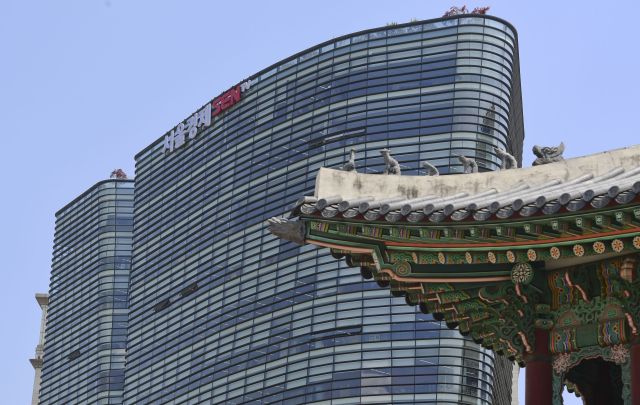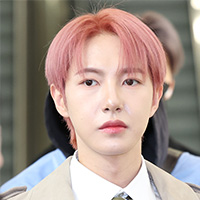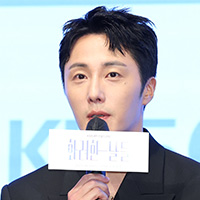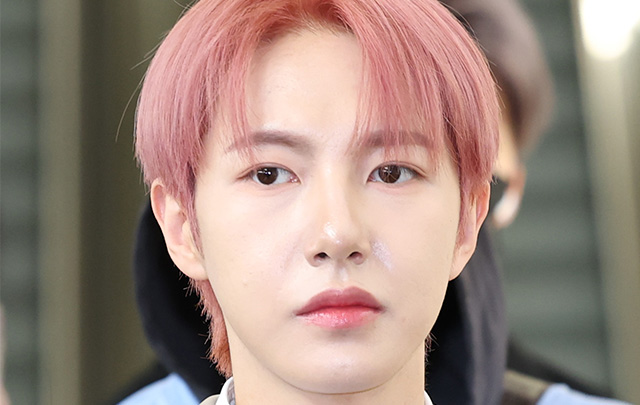자동차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특별한 존재다.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내구 소비재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무척 신중하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부터 부품·판매·정비까지 연관 산업의 고용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차량에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충전을 위해 전기 시스템과 연결되고 자율주행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망과 결합한다. 자동차가 전기·통신·교통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의 총화였다면 이제는 정보기술(IT)·반도체·배터리·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엄청난 변화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기계 부품을 만들던 기존 부품사들은 생존을 위해 사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모터·인버터 같은 전동화 부품사와 자율주행 관련 부품사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성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혁명 수준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기계 부품에서 전자·소프트웨어 부품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다른 기술과 인력·설비를 필요로 한다. 기존 전기·전자 계열 부품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어려움을 잘 아는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해 ‘경제안보촉진법’을 통해 배터리 생산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착수했다. 중국 역시 ‘미래산업 혁신발전 실시 의견’을 통해 미래차 부품 생태계 육성에 나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품 기업에 값싼 토지 제공, 세금 감면 등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한국은 어떤가.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탄탄한 기본기와 원천 기술이 있는 일본,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한 중국과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부품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 부품 기업들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기업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급하다. 미래차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차량을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킬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한국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차 부품 분야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행히 2024년부터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우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