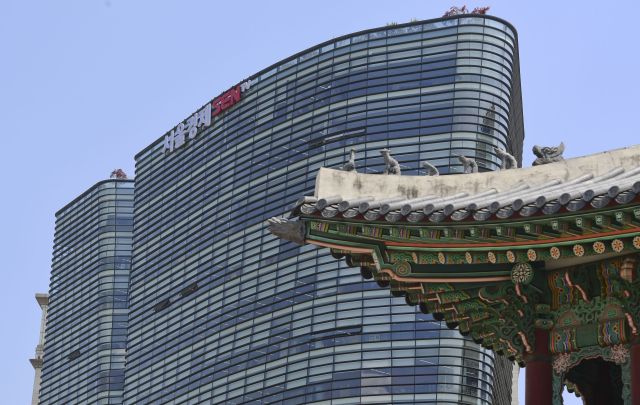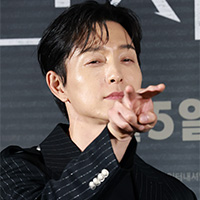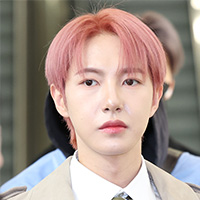전남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편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부지 평탄화 작업에 한창이었다. 2만 4000㎡(7300평) 규모로 들어설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장 부지다. 다만 아직 기초공사 단계인만큼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우주발사체(로켓) 기술과 발사 인프라를 앞세워 매년 발사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이 미국 스페이스X처럼 독자 기술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마음껏 쏘아올릴 발사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마존의 위성통신용 인공위성 ‘카이퍼’ 24기를 실은 발사체 ‘팰컨9’을 쏘아올렸다. 올해 들어서만 100번째 발사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연간 발사 횟수는 2022년 61회에서 2023년 96회, 지난해 134회로 매년 두 자릿수 늘었고 올해는 170회가 목표다. 지난해 미국(145회)이 중국(68회), 러시아(17회) 등을 압도하며 점유율 56%를 차지하는 데도 스페이스X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역시 미국에는 밀리지만 연간 100회 발사를 목표로 내세우는 동시에 유인 달 탐사 같은 고난도 임무에 집중하며 발사체 기술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유인우주국(CMSA)은 최근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란웨(蘭月) 착륙선 성능 검증에 성공했다. 2030년 이전 유인 달 탐사를 위해 누리호보다 추력이 12배 강한 최신 발사체 ‘창정 10호’도 개발 중이다.
반면 올해 국내 발사는 누리호 1건이다. 선진국을 본격적으로 추격하려면 발사체뿐 아니라 발사장 자립도 필요하다는 게 우주항공 업계의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군사위성처럼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을 해외에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발사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민간 발사장이 갖춰져야 안정적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누리호 기술이전을 받은 한화에어로는 물론 이노스페이스 같은 발사체 스타트업도 등장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국내 위성 발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은 전무하다. 국내 민간 발사장의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돼왔지만 그동안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다가 정부가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637억 원을 투입하는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장 구축 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발사체 경쟁으로 글로벌 우주 개척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에너지와 인프라 사업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2030년까지 달에 100㎾(킬로와트)급 원자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앞다퉈 우주 공간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