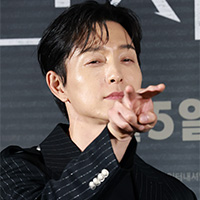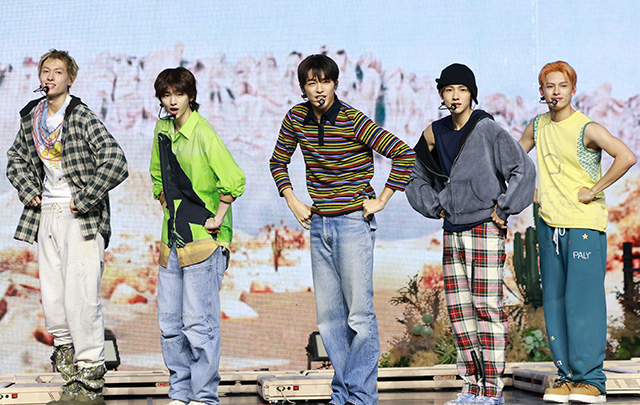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