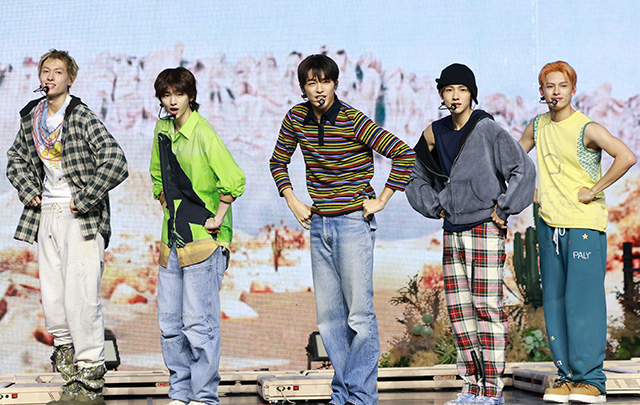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올 1월에 맺은 수출제한 및 시장 분할 합의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 사가 합작법인(JV)을 만들면 각종 우려 사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합의안에 근거해 따져봤다.
①“JV, 이사회서 논의된 바 없어”=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올 1월 미국과 비밀 합의 이후 WEC와 JV 설립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JV를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아직 구체화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JV가 대안은 맞지만 실체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미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 WEC가 합작회사를 만들 ‘당근’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JV 설립에 서명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서명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사가 JV를 설립할 경우 전 세계적인 독과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은 사실상 한수원과 WEC,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두 기업이 손을 잡으면 EDF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②“기술 사용료 지나치게 높아”=한수원·한국전력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제공하기로 한 항목은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보증 신용장 △WEC에 핵연료 최대 100% 보장 등 네 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WEC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WEC 전신인 ABB-CE와 1997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술 사용료로 10년간 약 30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1기당 금액이 아닌 10년 동안 지불하기로 한 금액으로 10년 동안 한국이 원전을 단 1기만 지었다고 해도 이번 협정에서 약정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업이 퀄컴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단말기 가격의 약 3~5%로 알려져 있다. 국내 조선 업계가 화물창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GTT에 지급하는 로열티 역시 선가의 5% 수준이다. 단순히 기술 사용료만 보면 로열티가 2.5% 안팎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원전은 기술 로열티 외에 물품·용역 구매 계약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린터를 팔아놓고 잉크는 팔 수 없게 막아놓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수원은 일종의 백지수표 격인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도 WEC에 보장해줘야 한다.
③기술 독립 첩첩산중…SMR도 족쇄=수출통제를 받는 노형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수원 등이 수출할 수 있는 노형은 일명 한국형 원전으로 통하는 APR-1400과 이를 바탕으로 설비용량을 조금 줄인 APR-1000뿐이고 이 둘 모두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과거 “우리 원전이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논란 이후 돌연 “기술에서 독립을 이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WEC의 원천 기술과 독립적인 새로운 노형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WEC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과 그 전신이 되는 OPR-1000을 개발하는 데도 각각 십 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그마나 상용화가 가까워진 소형모듈원전(SMR)은 경수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수출에 나서려면 WEC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i-SMR)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인정받기 전까지 어디에도 수출할 수 없다. 냉각재에 붕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WEC가 제공한 기술과 상당히 다르다는 분석도 있지만 원천 기술인 가압경수로 방식을 활용하는 이상 WEC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이 기술 검증 과정을 지연시키면 이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손을 놓아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④팀코러스로 미국 진출? 하도급 될 수도=일명 ‘팀 코러스(KOREA+US)’가 합의문상 진출이 막힌 미국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향후 300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된 미국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미국과 어떤 식이든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합의문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계획은 WEC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법적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WEC가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캐나다 기업 카메코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미국, 유럽(체코 제외), 일본 등 WEC가 진출하기로 한 국가에서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한수원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릴 때뿐이다. WEC와 팀 코러스를 구성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은 하도급만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jo@sedaily.com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