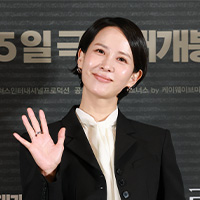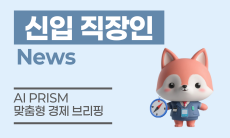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술' 소주가 매출 감소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의 주류 소비 트렌드가 다양해지고 있어 소주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처음처럼'을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의 상반기 소주 매출액은 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2194억원) 대비 3.4% 줄어들었습니다. '진로', '참이슬'의 하이트진로 역시 상반기 소주 매출액이 77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60억원)에 비해 0.5% 감소했습니다.
100년 역사 ‘소주'…코로나19 이후 “적당히 즐기자” 확산
소주는 1924년 첫 등장한 이래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시름을 달래온 한국인의 대표 술입니다. 회식·모임 등에 빠지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의 매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주류 소비 문화는 소주의 위상을 뒤흔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주류시장의 '큰손'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친 뒤 대학·직장의 회식 문화가 ‘마시고 죽자’에서 ‘적당히 즐기자’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류 출고량과 소비량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2019년 91만5596kl였던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꾸준히 감소해 2023년 84만4250kl, 2024년 81만5712kl 등 최근 5년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소주 소매시장 매출 규모는 2조3515억원으로 전년(2조4856억원)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20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도 2015년 9.813L에서 2022년 8.44L로 7년새 18%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술집 등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습니다. 특히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한 술 어디갔나”…부드러운 소주, 해외시장엔 안성맞춤
전문가들은 주류 소비 방식이 기존의 회식 등 단체 외식 중심에서 홈술·혼술 등으로 점점 더 다양해졌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젊은 층은 소주 소비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결국 소주와 맥주의 선호도는 줄어든 반면 Z세대 중심으로 와인, 위스키, 무알코올 음료, RTD(Ready To Drink ·즉석음용 주류)등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RTD 주류'란 하이볼과 같이 재료를 섞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과일향이나 탄산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RTD 주류 제품은 Z세대가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대표적인 RTD 주류인 하이볼 매출은 2023년 553.7%, 지난해 315.2%, 올 상반기 159.2% 늘었습니다. GS25에서도 RTD 주류의 매출 증가율은 2023년 319.6%, 지난해 93.4%, 올 상반기 77.3%를 보였습니다.
박상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RTD 주류 시장은 건강한 음주 문화와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따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2027년 26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드러운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통적인 소주의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업계에 저도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과거 독한 술의 대명사였던 소주도 알코올 도수를 지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다고 밝혔고, 앞서 하이트진로도 2023년 '진로이즈백'을, 지난해에는 '참이슬 후레쉬'를 각각 16.5도에서 16도로 낮췄습니다.
과거 20도를 넘겼던 소주의 도수가 15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발효주인 와인·사케 등과 비슷해져버린 것입니다.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알코올 도수는 낮아져 최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주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소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주류(일반·과일 소주)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일소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이 담긴 영상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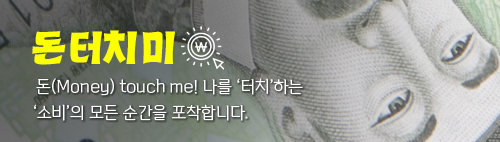

 seen@sedaily.com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