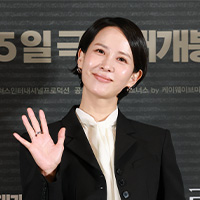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에 부풀었다. 기업의 안전 관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눈에 띄는 중대재해 감소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안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일까.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 환경은 언제나 정글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은 충돌한다. 어느 기업이든 ‘안전은 중요한 가치’이고, 실제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것 또한 전 직원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일인 것이다. 21세기 경영 환경을 드라마 속 ‘악덕 사업주’와 ‘선한 근로자’ 관계로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사고성 재해율은 0.5% 정도다. 대략 100인 사업장은 2년에 1건, 50인 사업장은 4년에 1건,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2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년간 1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사망 사고로 한정하면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거의 중대재해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다. 안전 체계 구축에 집중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놓인 생산·영업·구매·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매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보다 법적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률상 경영 책임자 의무의 불명확성과 처벌 위주의 접근 등이 현장의 안전 책임 회피와 서류 중심의 안전 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한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그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예방이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시스템 안전 및 인지 과학자인 리처드 쿡 박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18가지로 제시하면서 “중대재해는 주로 한 요소의 실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에서 일어나는 실패가 합쳐져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중대재해 ‘제로(0)’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3년 기준 223명이다. 276명(2024년 기준)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보다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일반 재해자는 많이 줄었지만 사망자 규모에 변화가 없자 ‘SIF(Serious Injury and Fatality)’라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전통 이론인 하인리히 법칙에서 벗어나 가용 자원을 중상해 재해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다.
안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엄벌 중심의 규제·정책은 적절한 것일까.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효율적인 사전 예방 수단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낫다. 더불어 효율적인 안전 정책은 손뼉을 칠 때 손바닥 두 개가 필요하듯 노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K팝·K방산에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처럼 한국의 문화와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는 요즘, 안전도 한국의 사례가 세계에 소개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